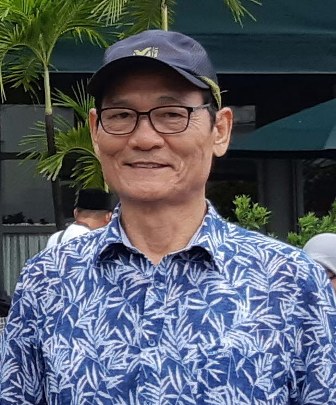한국문인협회 인니 지부 (185) 남해여행에서 깨달은 행복 /김준규
페이지 정보
본문
<수필산책 185>
남해여행에서 깨달은 행복
김준규 /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 운영위원)
쫓기듯 젊음의 의욕이 끝없이 넘쳐나던 적도의 황혼이 붉게 물들고 있다. 인고를 쌓아 올리며 하늘 끝을 점령한 기다란 야자수처럼 석양에 비치는 역정의 그늘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그리움들이 있다.
인도네시아 생활에서 잊고 살아온 고국에 대한 애착과 친지나 친구들과의 그리 많지 않을 만남의 기회에 대한 후회, 곰곰이 시간을 저울질하기에는 조급함이 먼저 앞선다. 잡다한 집착을 내려놓고 짐을 챙겨 한국으로 떠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초등학교 동창 몇몇 친구들과 남해 여행을 떠나기로 한 전날, 모자 점에 들러 무엇을 고를까 기웃거리고 있을 때 20대로 보이는 점원 아가씨의 눈동자가 힐끗 감추고 싶은 내 머리 쪽을 향했다. 그들의 아름다움과 한때는 동급이었을 풍성했던 머리 결, 빗질로 멋을 부리던 시절의 기억은 한 조각 일그러진 면경처럼 망각의 늪에서 아물거리고 있다. 당당하게 거리를 누비던 활력은 퇴행성 관절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절름대는 낯선 무대가 되어 간다.
남해의 독일인 촌 친구 집에서 묵기로 한 그날의 밤공기는 왠지 소슬하고 고즈넉했다. 서독 광부로 갔다가 진폐증을 얻고 설상가상 아내마저 저 세상으로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내려와 외롭게 살고 있다는 친구의 처지가 그렇다.
빈집처럼 적막한 정원에 인적의 그림자는 간데없고 무성한 잡초의 모습이 또한 그랬다. 외로움이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부러움 없는 물질적 여유로움, 경탄을 금할 수없이 오묘한 자연의 신비, 아름다운 꽃들이 주위를 에워싼다 하여도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을까, 황량한 벌판에서 마음을 끌어안을 사람냄새의 부재처럼 잔인한 외로움은 없을 것 같다.
초창기 이곳 마을에 정착한 독일 광부들은 나라에서 제공한 전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갔다고 했다. 밤이 되어 동화책에 나오는 인형의 집처럼 조그만 카페의 하얀 철제의자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 된 듯 녹이 슬어 있었고 외로움의 냉기는 엉덩이를 시리게 한다. 카페를 운영하는 할머니는 하얀 머리 결에 커트머리를 하고 삼베 적삼을 입어도 몸에 배인 비주얼이 이국적이다. 독일에서 귀국하여 정착한지 5 년 만에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혼자 카페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애써 쾌활한 듯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에 감추어진 우수가 저녁의 어두운 그늘처럼 스쳐간다.
검게 드리워진 수평선에서 알 수 없는 불빛이 가물거리다 스러지기를 반복하고 고개를 들면 높이 솟은 별빛이 우수수 쏟아진다. 어릴 적 놀이터가 되어주던 동네어귀의 공동묘지에 나란히 누워 별을 헤며 꿈을 꾸던 소년들이 어디선가 서로 다른 삶을 살다 한 바퀴 돌아와 호젓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애환으로 점철된 지난 세월의 잡다한 이야기, 더러는 시답지 않은 소소했던 일로 껄껄대며 남해의 첫 밤은 깊어만 갔다.
사각형 창틀에서 남도의 첫 아침을 내려다본다. 검푸른 바다에 비단치마가 굽이치듯 길게 늘어진 해무(海霧)는 깊은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며 비상하고 납작 엎드린 작은 섬들은 군데군데 등짝을 드러내고 심해에 발을 담근 채 무거운 침묵을 되새김한다. 잔잔한 물결 위에 가랑잎처럼 하느작거리는 고깃배는 긴 삼각형으로 물살을 찢어내 듯 인적 없는 섬을 돌더니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진다. 땅 끝의 탄생은 문여리로 태어난 막내의 운명처럼 척박한 해안선을 따라 뒤처진 외로움과 따돌림에 익숙한 듯 조용하다. 처마가 낮은 섬 집, 엉겅퀴가 무성한 밋밋한 야산엔 왜구들이 들쥐처럼 들락거리며 어지럽게 파 놓았을 역사의 아픔이 문신처럼 서려있다.
이순신 대교를 건너 한참을 섬 기슭의 얼기설기 숨어있는 도로를 달려 금산에 다다랐다. 칙 넝쿨처럼 헝클어진 혼란의 시대에도 이 길은 있었겠지, 그 옛날 천하의 그윽한 절터를 찾아 노승은 먼 길을 오느라 밑창 떨어진 마지막 짚신을 갈아 신고 명당이 될 남해의 끝단 금산을 알아봤을까. 섬의 기세는 두리둥실 봉긋하게 솟아올라 동백나무와 참나무가 무성하고 푸른 바다와 마주한 단아한 절벽엔 기괴한 모습으로 늘어선 바위들이 장엄하기까지 하다. 깎아지른 바위틈 사이에 제비집처럼 붙어있는 보리 암! 몇 번의 산굽이를 돌아서면 중독처럼 시야에 펼쳐지는 섬 군의 파노라마, 햇빛에 반짝이는 수평선이 멀어질수록 산정엔 구름을 휘어잡은 소나무 군락이 눈앞에 어지럽다.
봄 동산 솔잎 향이 무르익을 때 솔가지를 꺾어 껍데기를 벗기면 혀끝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오묘한 단물의 기억이 꿈틀댄다. 헤어지면 각자의 길로 돌아갈 친구들의 꺼벙한 모습처럼 산정에 잡힐 듯 피어나던 구름도 너울너울 바다위로 흩어진다.
남해 여행을 다녀온 후 인도네시아에 돌아와 몇 달이 지난 후 독일인 마을에서 홀로 폐렴과 싸우던 친구의 유고소식을 접하였다. 아이처럼 웃어 대던 얼굴들! 근심어린 표정으로 "우리 또 언제 만나지?“ 이별을 예고하던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구름을 타고 앉은 남해 금산에서 한 친구의 환하게 웃던 얼굴은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허공에 몸을 내밀고 숨 쉴 수 있으며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 할 수 있기에 더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은 없을 테니 말이다.
- 이전글(186)살라띠가 쿠쿠밥솥 소동 /이태복 21.11.26
- 다음글(184)빈 페인트 통에 대한 감상 /문인기 21.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