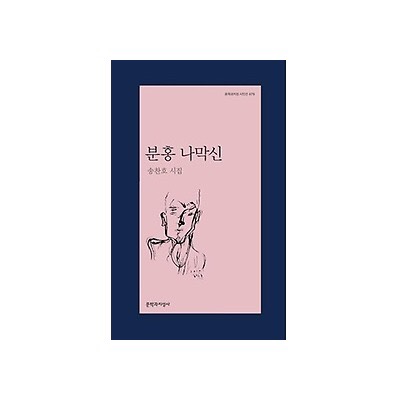자바에서 시를 읽다 ①
본문
만년필
이것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가 만년필 끝 이렇게 작고 짧은 삽날을 나는 아직껏 본 적이 없다
한때, 이것으로 허공에 광두정을 박고 술 취한 넥타이나 구름을 걸어두었다 이것으로 경매에 나오는 죽은 말 대가리 눈 화장을 해 주는 미용사 일도 하였다
또 한때, 이것으로 근엄한 장군의 수염을 그리거나 부유한 앵무새의 혓바닥 노릇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으로 공원묘지에 일을 얻어 비명을 읽어주거나, 비로소 가끔씩 때늦은 후회의 글을 쓰기도 한다.
그리하여 볕 좋은 어느 가을날 나는 눈썹 까만 해바라기씨를 까먹으면서, 해바라기 그 황금 원반에 새겨진 파카니 크리스탈이니 하는 빛나는 만년필 시대의 이름들을 추억해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된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지난날 습작의 삶을 돌이켜본다--- 만년필은 백지의 벽에 머리를 짓찧는다 만년필은 캄캄한 백지 속으로 들어가 오랜 불면의 밤을 밝힌다--- 이런 수사는 모두 고통스런 지난 일들이다!
하지만 나는 책상 서랍을 여닫을 때마다 혼자 뒹굴어다니는 이 잊혀진 필기구를 보면서 가끔은 이런 상념에 젖기도 하는 것이다 거품 부글거리는 이 잉크의 늪에 한 마리 푸른 악어가 산다.
시. 송찬호
*** 클릭 한번으로 온갖 정보를 얻고 잃는 세상을 산다. SNS에 올리는 한 장의 사진과 한 문장의 고백으로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한다. 모든 감정은 재빨리 소비되고 재빨리 포장된다. 만년필에 잉크를 채우고 혹시나 맞춤법이 틀릴까 고민하며 손가락에 힘을 주다가 강약의 조절이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며 편지를 쓰던 시대는, 헌 책방에 먼지를 둘러쓰고 누운 역사 책에나 나올 것 같은 시절이다. 그런데 가끔 그립다. 전동타자기로 시를 쓰는 선배가 부러워서 동아리 방에 놓여진 타자기를 슬쩍 눌러보던 오후. 끙끙거리며 시를 필사하던 저녁. 잉크병을 쏟아 책상에 파란 바닷물이 넘치던 밤. 그 속을 헤엄쳐 다니던 내 젊은 날의 고래 한 마리.
채인숙 / 시인. 2015년 <실천문학> 오장환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카피라이터, 라디오작가,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했다.
추천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