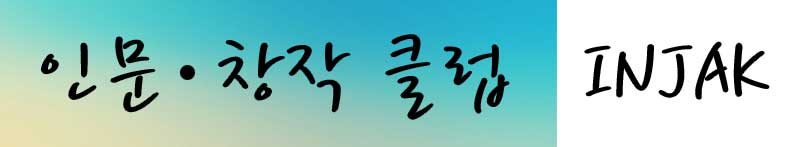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124) 특이점이 온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
페이지 정보
인문과 창작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20-01-27 14:42 조회 9,628 댓글 0본문
특이점이 온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배동선 /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중국, 일본, 미국 같은 나라는 한인교민사가 100년을 훌쩍 넘은지 오래고 2019년엔 프랑스와 대만이 교민 100년사를 편찬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 차례다. 자신이 일하던 은행에서 돈을 빼돌려 독립군자금을 지원했다가 발각되어 일제에 쫒기게 된 장윤원 선생이 중국을 거쳐 1920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전신인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바타비아에 첫 발을 딛은 것을 기념해 한인회에서 작년부터 10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자료수집과 집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9월 출간 예정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동포사회는 영미 대륙 선진국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인다. 100년이라면 현지에서 여러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 현지사회에 융화되고 편입되어 국가의 일부분을 이루는 게 보통이지만 인도네시아의 한인사회에 붙은 이방인이란 꼬리표가 여전히 너무나 선명하다. 왜 그럴까?
학병들, 징용자 1,400여명과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함께 깔리만탄과 말루꾸, 자바에 들어오기 시작한 1942년부터 쳐도 약 80년, 수교가 이루어진 1973년부터 치면 약 5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제대로 뿌리내린 한인들이 한줌도 되지 않는 이유는 교민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면 귀국하게 되는 공관원들과 지사원들이었기 때문이다. 임기 중 또는 임기를 마친 후 현지에서 독립해 성공적으로 독자적 사업을 일군 이들도 있지만 태반은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거나 쓰디쓴 사업실패 후 패자부활전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절치부심 무너진 가슴을 끌어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재인도네시아 한국교민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구한말, 또는 일제 강점기 간도와 중국, 일본, 미주로 나간 해외 이주자들에 비해 턱없이 짧았다. 인도네시아의 한인들이100 년이 지나도록 이방인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로 아직도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일 듯하다.
교민들의 문화 활동이 그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하러 온 나라’, ‘돈 벌러 온 나라’였던 인도네시아에서 본격적인 문화에 대한 공부와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에 당시 한국국제학교의 한 교사가 문화탐방을 시작하면서다.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인사회에 소개하는 문화탐방은 한인니문화연구원(사공경 원장)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330회를 훌쩍 넘겼고 유명인사와 학자들을 초빙하여 현지 문화, 역사의 식견을 넓히는 열린강좌도 70회에 육박한다. 이젠 다양한 한인 문화단체들이 어느새 교민사회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지 대학에 유학하거나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 현지에서 연구하고 학위를 받은 교수, 박사들도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100년의 기간이라면 그 나라의 문화와 지식을 현지인들에게 가르치는 한국인들이 얼마든지 자리잡을 만한 시간이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문화를 인도네시아에 소개하고 현지 문화를 배우는 단계, 즉 대체로 자기 것을 주고 남의 것을 받는 초보 교민 사회의 모습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대 양승윤 명예교수가 가자마다 대학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치를 비교 강의하고 안선근 교수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는 것 정도가 다음 단계에 깊숙이 진입한 모양새다. 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유럽인들에게 예술과 음악을 지도하는 한국인들처럼 인도네시아 것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가르치는 한국인 전문가의 출현, 그것이 연조 깊은 현지 한인사회라면 언젠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 특이점이다.
올해 2월 인도네시아 최대 출판사 그라메디아는 ‘Setan Lokal’ 이란 제목의 만화시리즈를 내놓는다. ‘토착귀신 이야기’ 정도의 제목이다. 채색 등 일부 과정에 현지인들도 참여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와 작화를 한국인들이 맡아 올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 귀신과 무속에 대한 100개의 에피소드를 창작해 다섯 권의 만화책에 담아 현지 독자들을 위해 인도네시아어로 출판하는 것이다.
이슬람 기치가 휘날리는 인도네시아의 수면 밑 무속문화를 한국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그려내는 이 작업은 그 특이점을 통과하는 또 하나의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한 두 개의 사례만으로 한인사회 전체가 특이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긴 힘들다. 한인들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에 적응하고 융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할 것이다.

<헤로니모 영화 포스터와 전후석 감독>
얼마전 뉴욕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헤로니모’를 통해 쿠바의 한인사회를 알게 되었다.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시킨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에 적극 가담했고 체 게바라와 함께 쿠바 공산정권 초창기에 신명을 다해 일했던 임은조씨 즉 헤로니모 임은 누구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특이점을 찍었다. 그후 그가 현지에 동화해버린 쿠바 한인사회에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인회 재건을 위해 말년을 모두 바친 이야기는 무척 감동적이다. 해외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특이점을 넘는 것도, 많은 노력과 희생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새삼 깨달았다.
작년 대사관저 오찬에서 만난 최초 교민 장윤원 선생 후손들 중 증손자의 혈관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는 12.5%로 희석되었고 국가와 교민사회가 그들에게 무관심한 동안 현지 화교사회에 완전히 편입된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특이점을 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외모로는 절대 한국인이라 알 수 없게 된 서구적 모습의 쿠바 한인들, 헤로니모의 후손들이 한국인 정체성을 지키려 애쓰며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노래하는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진출 100년을 맞아 예의 특이점을 넘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갈지, 현지에서 성장해 가는 우리 2세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물려주게 될지, 경자년 새해를 맞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 이 글은 '데일리 인도네시아'에 함께 실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