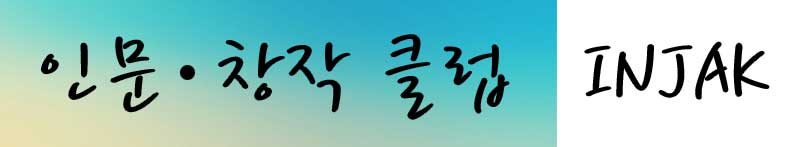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191) 이사
페이지 정보
인문과 창작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21-12-15 15:27 조회 15,416 댓글 0본문
이사
조은아
이사를 했다.
창밖으로 일년 내내 초록초록한 나무들과 시원한 바람이 불던 산꼭대기에서 도시의 한 가운데로 하산을 했다.
십 년 만의 이사는 설레임과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정든 곳을 떠나는? 아니다. 십 년 동안 숨기고 가두고 쳐박아 두었던 잡동사니들을 끄집어내어 마주해야 하는 번거로움, 버림과 보관의 끊임없는 선택... 미루고 미뤘던 ‘정리’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2살과 백일 갓 지난 아이들을 데리고 사계절 살림살이를 커다란 컨테이너에 꽉 채워왔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살림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니 이 이사는 대대적인 짐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대 ’청소라 하기엔 그닥 큰 집도 아니지만 박스에 담아 구석구석 숨겨둔 흔적들을 찾고 고르고 버려야 하는 미루고 미뤘던 숙제를 할 시간이었다.
‘그래 우리집은 수납장이 별로 없어서 보이는 게 전부이니 짐이 많지 않을 거야’는 나의 아주 큰 오산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전래 동화속 마법의 소금 맷돌이 우리 집에 있었나 보다. 멈추지 않고 끝없이 소금이 쏟아져 나오듯 짐들이 쏟아 나왔다.
“어머 이게 아직도 있어!”
이삿날을 잡고 매일 우리는 소금 맷돌 앞에서 연신 탄성을 질러댔다.
배냇저고리, 첫 양말, 수건, 모자, 백일과 돌 드레스와 한복,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만들었던 발바닥 석고상, 유리병에 담겨진 배냇머리카락, 넓이 225cm2의 백일기념 블라인드 등등 추억들이 쏟아져나왔다.
“너무 귀엽지? 너희가 딱 요만했어”
우리의 감동은 딱 여기까지. USB에 가득한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추억인 것을 나는 왜 무엇에 이끌려 이 많은 소품들을 만들었던 것일까.
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버릴 것인가? 보관한다면 누가 보관하게 될 것인가로 토론이 시작된다. ‘내 것이지만 엄마 아빠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엄마가 보관하는게 맞다’ ‘새 집 새 인테리어에 낡은 블라인드 그것도 백일 때 얼굴이 커다랗게 인쇄된 블라인드는 걸 수 없다’ 등등이 아이들의 의견이었고, 또 나는 차마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이가 인쇄된 그것들을 차마 버릴 수 없어 다시 둥둥 동여매어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아이들은 자랐고 해마다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했고 매번 사줘야 하는 것들이 달라졌고 멀쩡한 것들이 쓰레기가 되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아 우리 이때 정말 신났었는데 그치그치?” 라며 흥분해서 연 박스안에선 자카르타 팔램방 아시안게임 응원 용구와 기념품이 쏟아져 나왔다.
빨간 붉은 악마 티셔츠 네 장, 한반도 티셔츠 네 장, 그리고 모 은행에서 배포했던 응원스틱, 기념 스티커, 입장권, 인형... 특히 땀 뻘뻘 흘리며 끝까지 손에 땀을 쥐며 목이 쉬도록 ‘대 한 민 국’을 외쳤던 축구 금메달 결정전의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도 다 USB에 있는 장면들인데... 그런 행사가 또 있다면 누군가 또 만들어 배포할텐데...’ 안녕... 손흥민 만세의 추억들아...
내 옷장 안은 더 거슬러 올라간 추억들이 잠자고 있었다. 결혼 예복, 상견례 때 입었던 정장, 결혼 전 입었던 유행 지난 옷들과 심지어 대학 졸업식에 입었던 원피스까지 나는 무슨 미련으로 가지고 여지껏 저것들을 품고 있었을까?
언제고 살 빼면 입겠다, 유행은 돌아올 것이다, 비싼 거라서, 누가 선물해 준거라서, 특별해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았고 그러면서도 기억도 못한 그 이후로 한번도 꺼내보지도 않았던 옷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참 유행에 뒤쳐진 옷들과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빛이 바랜 것들을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곳에서 꺼내 놓으니 침대 위에서 방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왼쪽은 동대문, 오른쪽은 남대문 시장 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발로 길을 내면서 안쪽을 드나들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여행용 샘플, 해 지난 다이어리, 오래된 소형 가전, 수많은 사은품 그릇과 냄비, 원플러스 원의 흔적... 소금 맷돌은 매일 끝도 없이 기억의 소금을 토해내고 있었다. 20년은 끄떡없이 쓴다고 튼튼하다 소문났던 접시들은 그림이 벗겨지도록 이 하나 나가지 않고 정말 꿋꿋이 부엌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들에게도 나름 다 이유가 있긴 했다. 비싼 건데, 추억이라,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듯해서... 가져다 붙이면 하나하나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있겠는가.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가만히 방안을 둘러보았다. 과연 내가 이 안에서 매일 쓰고 있는 물건은 몇 개나 될까? 내가 자주 입는 옷들은 몇 벌이나 될까? 반대로 이 안에서 내가 일 년에 단 한 번도 손대지 않는 물건은 무엇일까? 언젠가는 ‘혹시나’라는 미련으로 품고 사는 물건이 과연 몇 %나 될까? 그 물건들에 붙어있던 잊고 있었던 소소한 장면들도 스쳐 지나간다.
‘저 신발 신고 아장아장 걸을 때 정말 귀여웠는데...’
‘첫 등교때 저 가방을 매고 신나서 달려갔는데...’
‘저 옷 입었을 때 예쁘단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큰 맘 먹고 산 것이었는데...’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은 유행에 뒤떨어진 저 짐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소한 내 마음속 미련이었다. 결국 ‘...었는데...’라는 문장 뒤에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없다. 지금은 달라졌다.’ 등의 표현들이 붙어야 하는 것이었다.
돌아보니 결국 나는 미련과 추억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었다. 몸은 현재에 있고 생각으로 미래를 꿈꾸면서도 내 몸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쌓아놓고 살았던 것들은 과거에 대한 나의 ‘미련’들이었다. 분명한 것은 버리는 순간에는 아쉽고 두렵지만 결국 뒤돌아서면 다시 찾지 않을 것들이라는 것이다.
나의 이사는 새로운 곳으로의 출발이 아니라 과거에서 나와 현재로 나오는 작업이 되어버렸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금 당장 대학 기숙사로 떠난다 가정하고 꼭 가져가야 하고,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남기고 다 버리자”고 제안했다.
우리 부부 또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도 고민하지 않을 만큼 딱 필요한 것만 남기자 했다.
요즘 이런 잡동사니를 가져다 쓰라고 한들 반가워 할 사람도 드물고 가격을 매겨 중고시장에 내놓자니 그 또한 손에 쥐는 것에 비해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우리는 그렇게 수 없이 많은 짐들을 깜뿡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사 후, 그렇게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짐 정리를 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미련’ 덩어리들이 또 나왔다. 아마도 이 정리는 이 집을 떠나는 순간까지, 아니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미련을 모으고 버리고, 채우고 비우는 일의 반복을 계속하지 않을까?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