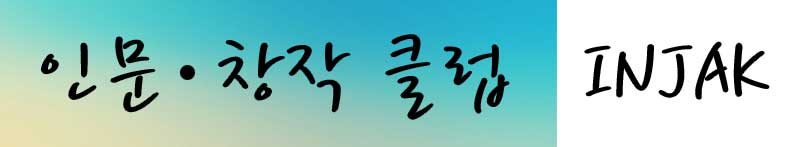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214)어느 봄날...
페이지 정보
인문과 창작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23-06-05 21:58 조회 1,655 댓글 0본문
어느 봄날...
조은아
어느 봄 날, 벚꽃이 새하얀 눈처럼 날려 길을 덮고 송진향이 바람을 타고 퍼져오르던 한국의 봄날... 나는 이 열대의 땅에서 아팠다.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병치레가 잦지 않고 나름 강단성을 자부했던 나인데, 남들은 두 서너 번도 걸린다는 코로나도 한 번 걸려본 적 없었던 나다. 심지어 코로나가 걸려 열이 펄펄 끓던 작은 아이를, ‘에라 나도 한 번에 같이 앓고 나자’는 각오로 끌어 앉고 잠을 자기도 했는데 작전 실패였다. 더 기막힌 건 주말에 이틀 와서 아이와 딴 방을 쓰고 간 남편은 코로나에 걸려 기숙사에 들어누워 있다는 전화를 받고 ‘아, 나는 돌볼 팔자지 누워 있을 팔자는 아니구나’ 했었다.
그랬던 내가, 아팠다. 딸들이 “엄마 아픈거 처음 봐. 무서워”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열, 통증, 오한 등등의 증세는 없다. 몸은 지구 저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듯 늘어지고 천근만근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가 없으니 난감했다. 아픈데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천만다행(?)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목도 아프지 않은데 노래 천 곡 쯤 부른 쉰소리가 나왔다.
아직도 반 이상이 남은 채로 서랍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스왑 테스트기를 찾아 꺼내 검사도 해 봤지만 코로나는 아니었다. 요즘은 PCR 검사를 어디서 하나? 궁금했지만 검색하고 찾아나갈 기운은 없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 애들이 보기엔 엄마가 단단히 탈이 났나 생각이 되었나 보다. 작은 애가 학교 가며 오며 자꾸 내 눈치를 보고 “엄마 아파?”를 백 번쯤 물어본다.
참... 르바란을 핑계로 내가 눈치를 보며 함께 살던 도우미도 돌려보내고 혼자 더 잘! 열심히! 치우며 살아보자고 팔을 걷어붙인 지 열흘은 되었나? 이 사단이 났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 큰 마음 먹고 사온 로봇 청소기 소리만 윙윙... 집안을 채운다.
요리와 설거지는 당분간 파업하고 배달 음식, 간편 음식으로 버텨보자. 안 먹던 남이 해 준 음식은 늘 새롭고, 재료 남을 걱정 없이 매 끼니 다른 메뉴를 먹을 수 있다니, 배달의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프다는 핑계로 쇼파에 누워 딩굴딩굴 해보았다. 천장에 쉭쉭 돌아가는 대형 팬을 보면서 스르륵 잠이 들기도 하고, 하릴없이 TV도 누워서 보았다. 강아지와 비슷한 자세로 바닥을 기어 보기도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멍 하니 하늘을 보기도 했다.
한국의 오월은 어땠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아이들 방학에 맞춰 여름이나 겨울에만 한국에 갔으니 벌써 10여 년이 넘도록 봄과 가을은 잊고 살았다.
큰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듯 하다.
“엄마 한국에도 가을이 있어요?”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럼 한국은 봄도 있고 가을도 있지”
“근데 왜 나는 왜 한 번도 못봤어요?”
“으...음...”
“언젠간 꼭 가을에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하던 천진난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작은 아이는 벚꽃은 가끔 자카르타의 몰에서도 볼 수 있으니 개나리꽃이 제일 보고 싶다고 했다.
사실 코로나가 인도네시아에 막 도착해서 모두가 어수선할 때 우리도 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다. 4월 중순, PCR 검사, 2주의 격리, 외출 외식 자제... 코로나로 얼어 붙었던 봄이었다.
개나리는 이미 꽃이 지고 초록초록 해졌고 저 멀리 길에서 한 두 잎씩 날아오던 벚꽃잎도 격리가 끝나고 나오니 사라졌다. 마을 어귀의 딸기밭은 봄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딸기를 직접 따보고 사먹고 하는 곳인데 그곳도 사람을 들이지 않고 길가에 딸기만 내어 두고 팔았다. 지금쯤 근처 딸기밭에서 날아오는 딸기향으로 온 친정 동네가 향긋할 것이다.
그랬던 코로나도 다 떠난 이 봄에 나는 아팠다.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열대의 봄에 몸이 천근 같음을 핑계 삼아 딩굴거리며 며칠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내리던 날의 그 후덥지근함/공사 중이던 자고라위 고속도로/ 검은 매연을 퍽퍽 뿜어내며 힘겹게 올라가던 뿐짝의 버스/ 영어 사전, 인니어 사전 두 개를 들고 찾아갔던 보고르 어느 시장 골목의 은행에서 4시간 걸쳐 만든 첫 인니 통장/ 끼타스 검사 한다며 시커먼 구둣발로 저벅저벅 거실로 들어오던 이민국 직원 / 다친 아이를 데리고 갔던 병원에서 오진으로 한국으로 갈 뻔 했던 기억... /자꾸만 게을러져 가는 나...
아... 덥다. 기운도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만 나서 더 더웠다. 청소기 소리만 윙윙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앓고 있으려니 좀 억울했다.
‘그래 좋았던 기억도 많아!’
뿐짝을 시원한 바람 / 브로모에 떠오르던 아침 해 / 롬복서 만난 거북이 / 짜리따 비치에서 실컷 사먹던 갯바위 낙지... 무엇보다 잘 자라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표... 갑자기 웃음이 났다. 미쳐... 역시 나도 호랑이 엄마구나.
이 어둡고 답답한 생각에서 내가 밀려나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웃기!
하교 후 거실 바닥을 등으로 닦아가며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를 보니 또 웃음이 난다. 엄마가 아프다고 자꾸 눈치를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더 이상 나도 소파에 등을 대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일어나자! 내가 좋아하는 5월인데’
며칠 참 잘 쉬었다. 그동안 이렇게 게으름을 부려본 적이 있던가 싶었다. 아프지도 않은 아픔을 핑계로 오롯히 나만 생각하며 보낸 시간이었다.
오월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던 나의 오월은 지나갔다. 그리고 내 나이 마흔 아홉, 아홉수의 오월.
탄생과 함께 1막, 취직과 함께 2막, 결혼/출산/육아의 3막...그리고 나는 지금 아이들이 떠나가고 남편과 둘이 남을 4막을 준비 중이다.
연극의 막과 막 사이에 휴식이 있는 이유는 옷을 갈아입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라는 뜻이다. 전막과 똑같은 옷으로 똑같은 분위기만 이어진다면 연극이 너무 지루할 것이다. 밤이 있는 이유도 그래서일까? 오늘 골치 아픈 일들을 밤 사이 정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으라고?
먹거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신분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1일이고, 언제든 다시 시작일이 될 수 있다.
마흔 아홉의 오월, 나는 다시 일어났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