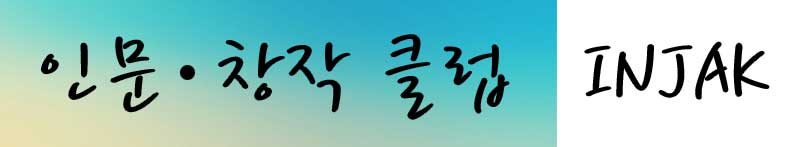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212) 그 밤의 바다
페이지 정보
본문
그 밤의 바다
김현숙
그날 바다에 간 건 그저 운명이었을까?
나무들은 축 늘어진 날갯죽지를 땅에 처박고
나룻배 허리춤의 낡은 타이어가 고무타는 냄새를 풍기던 날이었지
갓절인 생선의 소금기가 내 목덜미에서 온종일 서걱이던 날이었어
하지만 그 밤의 바다는 참 이상했어
코코넛 살 냄새를 품고 있었지
칵테일 파티의 낮고도 매혹적인 선율이 물결위에 살랑이고 있었어
술 한잔 없이도 취기가 올라 콧노래가 입가에서 맴돌았지
보름달조차 칠흑같은 바다를 훤히 비출 수 없었어
갑자기 그 검은 심해의 배를 가르고 허연 포말이 달려오기 시작했어
내 가슴을 세차게 치고 부서지고 사라졌어
그래도 바다는 다시 일어서 또 포말을 뱉어냈지
나의 유년시절이 그 안에서 선명히 살아났어
포말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고래 같았지
다음엔 맑았던 나의 20대가 오고
나의 사랑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무르익어가는 우리의 중년이 역사책의 목차처럼 밀려왔어
포말을 휘감은 음악은 때론 느리고 조용하게 때론 격정적으로 빨라지기도 했지
한참동안 종잡을 수 없던 마음이 가라앉자 바다는 이내 경쾌한 춤을 추는거야
더 리드미컬하게 허연 포말이 다가오고
바람은 야자수의 손을 잡고 빙빙 돌기도 했지
잠 못드는 바다에 내가 온 건 그저 우연이었을까?
캄캄한 무대에 나를 세우고 고요하고 집요하게 나를 찾던 밤이었지
- 이전글(213)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는 소회 23.05.04
- 다음글(211) 나무로 태어나 바다에서 일생을 마치다 -술라웨시 전통 범선 삐니시(Pinisi) 23.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