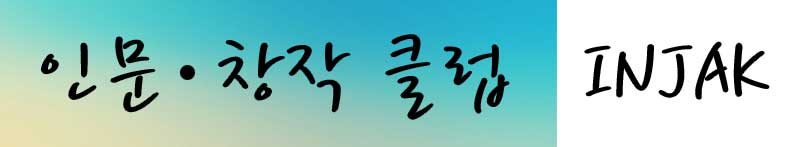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176) 아!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아!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
홍윤경 / Pleats kora Indonesia 대표
그날의 족자카르타는 하늘이 노한 듯, 평소의 스콜보다 더한 마치 물대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날이었다. 나는 한국서 오신 손님들의 관광을 책임 맡아서 발리와 족자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중이었다. 그 시절 나는 인도네시아 UI 대학에서 언어를 공부하며, 방학 때는 관광통역을 해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나름대로 관광 가이드를 하기 전에 나는 나에게도 생소한 인도네시아 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 공부했다. 그러다 보니 아는 만큼 보이는 건지,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안달을 내곤 했다.
이미 발리 여러 곳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동남아 관광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던 한국의 손님들은 모든 게 시큰둥했다. 너무나 엄청난 규모의 관광지를 일일이 걸어 다녀야 하는 것에 짜증을 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후덥지근 끈적끈적한 습도를 못 견뎌냈다.
발리에서의 관광에 지쳐버린 손님들을 모시고 족자카르타로 넘어오는 일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까닭은 단순히 그들의 짜증뿐 아니라 우기에 수시로 쏟아붓는 스콜도 한몫하고 있었다.발리에서 족자카르타로 넘어오는 비행기는 당연히 지연되었고, 한국과 사사건건 비교되는 인도네시아의 서비스 문화에 이젠 짜증을 내다 못해 한국의 손님들은 언성을 높이며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다.족자카르타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일이 꼬이려는지 손님들은 연착된 비행기에 지쳐있었고, 동남아 특유의 스콜로 비까지 쏟아붓는 공항에서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이런저런 의견을 수립한 끝에 공항에서 바로 관광지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 호텔로 버스를 돌렸다. 호텔로 들어가는 길 관광버스 안에서 CANDI PRAMBANAN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한국 손님들의 마음을 돌려, 한 명이라도 더 CANDI PRAMBANAN과 만나게 하고 싶었다. 9세기에 건축된 CANDI PRAMBANAN은 앙코르와트 사원보다 200여 년 이상 앞서서 세워진 사원이며, 악마의 도움으로 하루 만에 지어졌다는 전설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CANDI PRAMBANAN이 들려주는 속삭임들을 전했다. 그러나 한국 손님들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한국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니 한국식당과 마사지나 쇼핑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다.
호텔에서 좀 쉬다 비가 그치면 그때 움직이겠다 했다.그래도 여기 족자카르타까지 오셨는데…….
자꾸만 우물우물 잦아드는 나의 소심한 가이드로서의 고집도 내리는 비를 보고 있자니 스멀스멀 내리는 비에 씻겨나가는 듯했다.
이곳은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천년고도 경주 같은 곳인데……. 800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세상에 드러난 곳인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동남아 전 지역에서 가장 큰 힌두 사원인데…. 나의 애타는 설득은 무섭게 내리는 빗소리에 묻혀 조금도 손님들에게 가 닿지 않고, 나도 이 정도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라 하며 포기하고 호텔로 가버리자 하는 순간…….
그 순간 딱 한 분이 CANDI PRAMBANAN을 보고 싶으시다고 요청을 해왔다. 그 한 사람의 요청으로 힘이 난 나는 함께한 다른 손님들을 다시 설득했고, 다행히 호텔로 향하던 버스의 방향을 돌릴 수 있었다.
CANDI PRAMBANAN이 저 멀리 보이면서 살며시 걱정이 밀려왔다. 어중간해야지 이건 어째 우산으로도 가려질 수 있는 정도의 비가 아니었다.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시야마저 흐려지고 있었다. 공항에서부터 준비한 일회용 우의를 입고 우산으로 어떻게 버텨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했다. 이거 어째 CANDI PRAMBANAN까지 가서 다시 차를 돌리게 되는 건 아닌지? 에고 이번 가이드는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인지? 원래는 잠깐 내리다 그쳐야 할 스콜인데 주야장천 내리퍼붓는 스콜이 다 원망스러웠다.
CANDI PRAMBANAN의 주차장에 미니버스를 주차하게 시키고 보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밖의 상황에 손님들도 역시나 그냥 차에 있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른 손님들을 버스 안에서 기다리게 한 채 단 한 사람의 손님과 나는 우의를 입고 차에서 내리며 우산을 급하게 펼쳤다. 내 발이 땅을 밟은 그 순간부터 후회가 물 밀 듯이 밀려왔다. 괜히 우겼구나…. 그냥 호텔로 갈 걸…. 왜 사서 고생……. 하여간 오지랖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등등
쏟아지는 빗속을 헤엄치듯 헤쳐내며 입구를 지나 메인 사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도 멀고 멀었다. 우의를 입고 우산을 썼지만 이미 옷은 흠뻑 젖어버렸고, 설상가상 우산은 무섭게 내려 붓는 비의 속도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고 말았다.
사실 메인 사원으로 가는 길은 몇 차례 가이드로 인해 다녀간 내게는 익숙한 길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그 길은 초행길인 듯 생소했다. 보도블록이 아닌 물안개로 길을 깔아놓은 듯 물안개를 헤쳐내며 걸어갔다. 시야가 흐려서 그런가 하고 두리번두리번 찾아보았지만 그 사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용감했던 손님과 나 단 두 사람이 전부인듯했다.
하긴 이런 날씨에 사원을 보겠다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인지도 모르겠다.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하고 메인 사원으로 들어오니…. 멀리 흐릿하게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신인 시바의 신전만 보일 뿐 브라마 신전과 비슈누 신전은 물안개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다. 어떻게든 우선 비부터 피하자 싶어 눈에 보이는 브라마 신전을 향해 몇 계단 올라갔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나마 비를 가릴 만한 곳에 서서 돌아다보는 찰나 아……. 그곳은 ‘몽한경구’였다.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태어나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라 색채를 띤 물안개가 온통 신전을 둘러싸고 있었고, 시야에 들어온 각 신전의 고고함은 몇 세기를 죽어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며 그날 세상을 향해 걸어 나오는 듯했다. 꿈속에서나 볼 수 있다는 황홀하고 환상적인 경치라는 의미의 ‘몽한경구’ 또 다른 의미로는 귀신마저도 홀려버릴 정도의 너무도 위험한 풍경이라 하여 마한 경구라고도 한다는 풍경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했다.
순간 그곳의 두 사람은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었다.
아!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
무서웠다. 죽고 싶을만큼 아름답게 무서웠다. 평생 또 이런 광경을 눈 앞에 펼쳐놓고 볼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떻게 사원을 빠져나와 그 빗속을 뚫고 버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버스에 올라타니 버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뭔가에 홀린 우리를 보고 한마디씩 했다. 그 말도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순간을 함께했었던 관광객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날 본 것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원하든 원치 않던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고, 눈 앞에 펼쳐진 그 순간의 정적들이 가슴에 화인처럼 박혀버렸다. 그리고 그 삶에서의 한순간이 느닷없이 삶의 한 가운데 떠올라 오면 CANDI PRAMBANAN을 다시 찾게 된다.
그 이후 오래도록 몇 번을 다시 찾아 나선 CANDI PRAMBANAN은 헤어진 옛사랑처럼 날 모른척했다. 그럴 적마다 가슴에 와 닿는 서늘함이 마치 사랑에 버림받은 듯 날 아프게 했다. 아!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한마디를 하게 한 그 모습의 순간을 이젠 허락하지 않는다. 너무나 찰나여서 사진조차 찍지 못했던 그 날의 CANDI PRAMBANAN.
어쩌면 정말 CANDI PRAMBANAN은 악마의 도움으로 하루 만에 건설된 사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CANDI PRAMBANAN
- 이전글(177) 나의 바틱 사랑 30년 21.05.10
- 다음글(175)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국제화: 유학생들의 시점에서 본 현재와 미래 21.0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