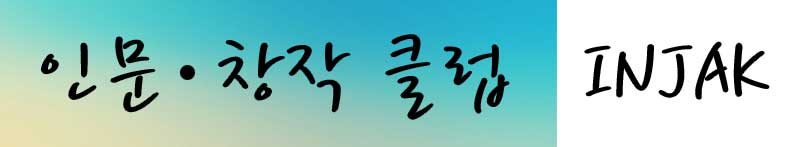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129)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남기- 나만의 인니 연관 검색어
페이지 정보
본문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남기- 나만의 인니 연관 검색어
조현영
어느새 인니 생활 20년차에 들어선다. 3년만 살고 돌아가자던 계획은 그저 계획이었을 뿐, 다들 그렇게 시작해서 20년을 훌쩍 넘기게 된다는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인니에 한번 발을 들였던 사람은 자바의 여신이 당겨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썰’이 3년차를 넘기니 진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생활은 단순했다. 해외에서 사는 일은 꽤나 근사하고 버라이어티할 줄 알았던 막연한 기대는 하루하루 적응하고 사는 데 집중하느라 일찌감치 사라졌다. 그곳이 어디였더라도 살아내야 할 기본에 낯선 환경이라는 옵션만 추가됐을 뿐.
초창기에는 다른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는 것 만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의 가족, 친구를 불러 들였다. 5년 차가 넘어가면서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버거웠다. 버라이어티한 외국생활이 이런거였나 싶었다. ‘가지가지 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혹여 누구라도 찾아올까봐 그때는 아무소리도 내지 않았다. 10년이 훌쩍 지나고 나니 많은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렇게 서서히 인도네시아에 스며들었다.
****
처음 도착한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냄새와 공기, 이국적인 분위기의 아파트와 수영장, 어두운 밤 거리,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없는 길 ( 차량 중심적), 자띠 가구( 내 취향은 아니나 감탄할 만한 솜씨), 지루한 초록색 이파리와 노란 캄보쟈, 갑자기 쏟아지던 우기의 스콜, 그 비에 오토바이 세우고 길가에서 비 긋는 풍경 (서두르지 않는), 아파트 하얀벽에 찌짝 (마주칠 때마다 매번 깜짝), 흰 개미 라얍 ( 나무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던 이층 주택 창가), 이슬람 사원의 아잔 (새벽 단잠 제대로 깨우는), 비가 잠긴 아파트 뒷동네 (차 지붕만 보였던).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신발 가격표보다 적은 가사 도우미 월급 (2001년도 도우미 월급이 35만 루피아였다), 심심치 않았던 기사와 도우미 관련 해프닝(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쏟아져 나올 법한 이슈), 눈에 보이는 그들의 거짓말, 수백만 가지의 핑계와 변명 그리고 의심 (자카르타에서 얻은 고질병), 루피아 화폐단위(나 부자인줄), 교통체증, 지켜지지 않는 약속 (납기 1달 지연은 기본).
전화선으로 연결한 인터넷(전화오면 뚝 끊어지는,하..), 인터넷 한 페이지 넘어갈 동안 바라보던 창 밖의 지평선(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확인), 성모유치원(한국어 유치원이라니 와락), 특례입시( 12년을 버티게 하는), 오래 보관했던 신발 신고 나간 날의 당혹감(걷다가 떨어져 나간 신발 밑창. 어쩔), 오자 마자 배운 골프 (구력만 늘고 있는), VHS비디오테잎 대여(보고 싶은 편이 없을 때의 실망감이란..대장금), 이민국, 비자.
작은데 거대한 오토바이(4식구가 탔는데 짐도 실려), 바틱(아름답지만 내겐 어울리지 않는), 한인니 복합어의 대표적 사례 ‘pulang하지마’(레전드로 남아 있는 웃픈 에피소드), 화려한 쇼핑몰과 초라한 서비스, 아기를 안고 구걸하는 여인, 3in1시내 통과를 위한 조끼(Joki, 대놓고 편법), 으슥한 밤골목의 벤쫑(여장 남자), 짝퉁 명품 시장 (그 와중에 특급은 dari korea), 버스 지붕 위에 올라탄 군중, 마을버스 kopaja (코파자,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큰 웃음 안겨주던), 동네잔치 대형 스피커에서 울려대는 당둣(dangdut)가락(나도 모르게 내적 댄스).
찰기 없는 쌀 (고슬고슬 맛있는), 사 먹는 물, 르바란 금식, 자차로 돌아보는 따만 사파리, 반둥가던 고갯길 파인애플(개꿀맛), 뿐짝 꿀 고구마, 삼발 뜨라시, 미고렝, 나시고렝, 고렝안(최애 인니 메뉴), 썩지 않는 빵(이거 먹으면 안 늙을지도 모른다는 착각 주의), 까끼 리마(Kaki lima)의 진실 (밥 공기 하나에 밥숟가락 하나가득MSG), 손으로 먹는 식사 (어쩜 흘리지도 않아).
간간이 들려오던 한인 사건사고 소식, 몇 단어로도 통했던 인니어 (주재하는 3년 동안 손가락과 ‘ini’ 하나로 잘 살았던 어떤 그녀), 얼마 안가서 배우러 간 인니어 강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BIPA 할걸..약간 후회), tidak apa-apa (두루두루 참 편리하게 쓰이는, 띠따빠빠..자꾸 듣다보면 빡치는).
****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던 인니생활 선배들의 말씀은 살면서 저절로 알아졌다. 되면 고맙고 안되면 말고다. 오죽하면 고무줄 시간(Jam karet)이라고 할까 싶게 안 지켜지는 약속들에 은연 중 나는 동화되어 갔다. 자카르타에서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공공연한 핑계 뒤에 숨어서.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았던 그들의 말 속에서 진심을 찾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끝도 없이 늘어놓는 핑계를 걸러낼 줄도 알게 되었다. 아주 천천히 경계를 허물어 갔다.
‘인도네시아에 사는거 좋아요?‘ 불쑥 받은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다. 나름 잘 적응하며 산다고 믿었던 나 조차도 의외였다. 어쩌다 오게 된 인도네시아였고 간간이 힘들었지만 누릴 수 있는게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물개박수치며 좋다고 하기엔 불편함이 많았고 결핍도 많았다. 그렇다면 ‘좋았다 싫었다 한다’가 대답일까.(어정쩡한 내 성격때문인가)
애초에 인도네시아의 삶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 남편의 일을 우선으로 결정했고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것을 피하고자 따라나선 길이었다. 그렇게 정해진 나의 수동적인 결정은 내가 인도네시아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만들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속마음을 깔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곁을 주지 않았으니 좋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없었던 이유다. 시간이 지나서야.. 사실은 이 글을 쓰면서 깨달았음을 털어놓는다.
인니에 있었던 이 시간들을 한국에서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이 혹은 미련이 무쓸모한 일일지라도, 내가 발 딛고 사는 곳이 어디였든 지금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거란 결론을 내리고는 ‘ 나는 인도네시아가 좋아’라고 혼잣말을 내어본다.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내게 될지 모르겠으나 남아있는 시간들 만큼 또 다른 연관검색어는 늘어날테지. 이를테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나와 눈을 맞추고 순수하게 웃어 주던 그 소녀, 회색벽 앞 그림 같았던 길가의 꽃나무, 우기에 나타나는 연탄불 같은 노을빛, 뾰루퉁한 심기를 누그러뜨리는 은은한 자바 커피향,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던 길 모퉁이 바람의 위로.. 같은 아름답거나 다정하며 따듯한 단어들 말이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나와 눈을 맞추고 웃어 주던 그 소녀 (사진=조현영/manzizak)
* 이글은 '데일리 인도네시아'에 함께 실립니다.
- 이전글(130) 쿠키를 추억하다 20.03.12
- 다음글(128) 프라무디아를 기억함 20.0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