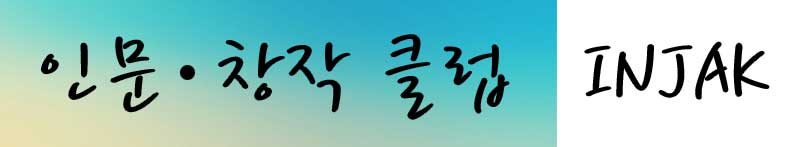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131) 보고르를 떠나며
페이지 정보
본문
보고르를 떠나며
조은아
“엄마, 이거!”
작은 아이가 또 등뒤로 다가와 주먹을 내민다.
“노 땡큐!”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후딱 대답해 버린다. 모르는 이가 보면 참 무심한 엄마구나 싶겠지만 나는 속으로 떨고 있다.
그녀가 살금살금 다가와 손을 내밀며 나를 부를 때는 대부분, 손가락 사이로 검붉고 연필만큼 굵은 지렁이가 꿈틀거리거나 자기 주먹만한 귀뚜라미를 들고 있거나, 아기 찌짝을 주먹 안에 감추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고르 외곽의 이 산골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왠만한 곤충은 그냥 애완견 같은 친구다.
올해로 우린 이곳에 온지 10년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큰 아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카르타 시내로 이사를 갈 예정이다. 드디어 하산이다.
솔직히 이 보고르 산골의 첫 인상은 꽤 절망이었다. 넓은 정원과 저 아래로 보고르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이곳은 그야 말로 공기 좋은 별장이었지만 처음의 나에게는 낯설고, 외로운 유배지였다.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 광케이블은 꿈도 꿀 수 없었으니 인터넷 방송은 먼나라 이야기였다. 처음 5개월 동안 나에겐 동요 CD와 만화 DVD가 유일한 매스컴이었다. 말 그대로 나는 오지에 살고 있었다.
남편이 회사를 가고 나면 세 살짜리 큰 딸이 나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다. 병원도, 슈퍼도 뭐든지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 고속도로를 달려야 했다. 손발짓으로 무엇이든 해결해야 했다. 기저귀와 아이 것으로 꽉 찬 내 가방에는 무거운 영어 사전과 인니어 사전까지 무게를 보탰다.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누가 말이라도 걸까 두려워 유치원 도서관 구석에서 열심히 책 읽는 ‘척’을 하기도 했었다. 나의 하루하루는 전쟁이었다.겉으로 보기에 나는, 전원 주택에 살며 육아에만 전념하는 행복한 주부였지만, 나는 백조였다. 물 밑에서 숨차게 발길질을 해야 했던.
인도네시아 생활 첫 해, 달력의 12월은 첫눈의 설레임이 아닌 우기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유치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던 큰 아이가 조잘조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푹 떨궜다.
“엄마...”
“왜 아가?”
“엄마, 우리 이제 그만... 비행기 슈융 타고 할머니한테 가면 안돼요?”
“...”
세 돌도 안된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단호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속으로 삼키고 삼키다 폭발해 버린 것이었다.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다.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을 핑계로 한국으로 가출을 했었다. 비장하게 아이 둘을 엎고 안고 비행기를 탔건만, 내 인생 첫 가출은 매일같이 아빠를 찾는 배신자들 덕분에 한 달 만에 마무리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현지 시장에서 넉살 좋게 흥정도 한다. 곧 떠날 날이 아쉬워 괜히 낯익은 거리를 다녀보곤 한다. 보고르에서의 10년은 내 인생의 발전기였다. 나를 보듬어주던 보고르와의 이별을 앞두고 나는 새삼 감회에 젖는다.
내가 그리워할 보고르
끄분 라야. 시원한 나무 그늘 사이로 걷는 아침 산책, 아이들이 신나하는 곤충 채집과 식물 채집, 금색 모자에 빨간 스카프를 맨 새하얀 유럽식 대통령궁과 그 정원에 뛰노는 사슴들, 한 앵글에 다 담아보는 것이 소원인 쌍둥이 거인나무, 연꽃 가득한 연못과 넓디 넓은 정원을 내려다보며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한 앵글에 정말 담을 수 없는 끄분라야 쌍둥이 나무 (사진=조은아)
뿐짝. 사뚜 아라(Satu ara)를 노련하게 이용해 달리는 잘란 뿐짝, 새벽 이슬 가득한 구눙 마스의 차 밭, 뿐짝빠스에서 밤에 즐기는 따뜻한 코코아와 하얀 입김, 찌빠나스 중국 식당의 바삭한 개구리 튀김과 삐상고렝, 찌보다스 끄분 라야 트레킹, 물담배 냄새와 사과차 향 가득한 아랍 타운, 잘란 뿐짝에서 제일 유명한 Pak Haji Kadir사떼(Sate)와 아시난(Asinan) 보고르.
센뚤. 레인보우 힐에서 내려다 보는 경치와 정상에서 마시는 와룽 커피, 파라다이스 공원의 비다다리 폭포, 구눙 빤자르 솔나무숲과 계곡, 파인 포레스트에서의 야영, 이탈리아 아저씨가 화덕에 구워주는 따만 부다야 핏자 식당, 정글 랜드 초입 식당가 벤치에서 앉아 먹는 아이스크림.

▲시원한 그늘로 달리는 뿐짝 (사진=조은아)
우리집. 창문을 열면 집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살 아래 바짝 마른 이불들, 이층 테라스에서 야경을 즐기며 먹는 삼겹살과 소주, 밤 풀벌레 소리와 아침 새소리, 맨 발을 감싸는 정원 잔디의 포근함, 꽃 향기 가득한 밤 산책, 벽난로에 구워 먹는 감자와 고구마.
사람들. 우리 학교 선생들과 교직원들(전교생 30여명이라 모두가 가족같음. 내 생일도 학교에서 챙겨줌), 아침 등굣길에 자주 만나는 조꼬 위도도 대통령 행렬(매번 우리를 길에 세워두고, E-toll 카드 없이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의 꿈을 심어주심.), IPB 대학 여성회(지구 사랑 실천으로 나를 이끌어 준 이부Ibu-이부Ibu), 빠사르 잠부두아에 야채가게 아저씨(매번 덤을 듬뿍듬뿍 넣어줌), 단골 바나나가게 할아버지(언제나 맛난 바나나를 공평한 가격으로 주심).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리울 나의 친구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때, 나에게 다가와 준 친구들. 지금은 케냐에 살고 있는 스위스인 미랭과 다니엘, 미얀마 근무 중인 미국인 리사와 아론, 이스라엘로 돌아간 에이미와 얼.
리니, 빌리아, 리나, 테스, 비니 수많은 보고르 친구들. 10년 동안 그들은 내 가족이었고 자매들이었다. 한국에 자주 가지 못하니 외로울 거라며 시시때때 친 딸처럼 챙겨주시는 나의 인도네시아 부모님 꿍꿍과포포. 다시 못보게 되는 것도 아닌 데 벌써부터 마음이 아리다.
좁은 바닥이다 보니 우리는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종종 있었다. 발리 따나롯에서 “보고르에서 왔지?”라며 반갑게 인사하던 현지인 커플(보고르 어느 약국에서 우리를 본 적이 있다함), 롬복행 비행기안에서 만난 애들 학교 동네 아저씨(우리 애들 이름도 알고 있었음), 식물원 산책길에 만난 아줌마는 내 친구 고등학교 동창(너무 반갑게 인사해서 내 친구인 줄 착각함). 순식간에 내 시야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재빨리 찾아주는 토이 시티와 그란미디어 직원들. 잘 알지 못해도 어디서든 만나면 반가운 친구가 되게 하는 마법의 도시가 바로 보고르였나 보다.
나는 이 여유 넘치는 곳에서 깨알 같은 걱정들을 웃어 넘기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관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감사한 덤이었다.
이삿날은 아직도 두어 달 남았는데 나는 벌써부터 가슴이 콩콩 뛴다. 이곳이 정말 많이 그리울 것 같다. 보고르. 그동안 참 고마웠다.

▲구눙 뿌트리 트레킹 (사진=조은아)
*이 글은 '데일리 인도네시아'에 함께 실립니다.
- 이전글(132) 바오밥 나무와 나시고렝 20.03.25
- 다음글(130) 쿠키를 추억하다 20.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