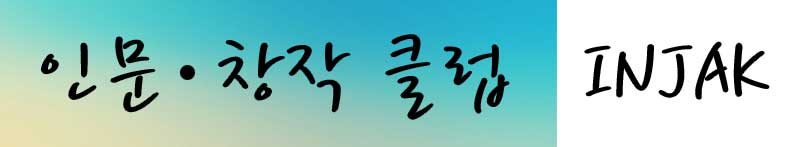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46) Rudi에게
페이지 정보
본문
Rudi에게
김기역
야근을 마치고 회사 앞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담배를 하나 피워 물고 걸었다.
“Permisi~!”(실례합니다~!)
웬 아낙네 목소리에 돌아보니 기다란 인도네시아 리어카를 끄는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가 씩씩하게 나를 비켜간다. 리어카에 플라스틱 병들과 박스 폐지 등을 담은 작은 마대자루들이 있었고 그 마대 더미 위에 앉아 덥수룩한 머리의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거리에 책을 읽는 애들이 있다?’
‘Eti’(에띠)와 ‘’Rudi’(루디) 남매는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인도네시아에 지내면서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늘 안타깝고 의아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야밤에 리어카를 끄는 아주머니와 거기 올라타 책을 보는 어린 아이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에 치여 분주했을 어느날 회사 앞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리어카 아주머니를 또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편의점 앞 쓰레기통을 뒤져 재활용기들을 주워 내고 있었고 아이들은 해맑게 깔깔대며 뛰놀고 있었다. 리어카에서 책을 읽던 기특한 녀석들… (세상 여느 아이들이 귀엽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아이들은 유난히 귀엽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이 조그마한 얼굴에 크게 자리잡은데다가 짙은 속눈썹이 너무 예쁘게 치켜 올라가 있는 아이들…) 책을 좋아하는 기특한 저 녀석들 먹는 건 잘 먹고 지내는 걸까? 얼른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Teh Botol* 테트라팩 음료수를 3개 샀다. 계산을 하며 옆에 있던 츄파춥스 캔디도 2개를 사 봉지에 넣었다.
“Ibu, Boleh kasih minuman untuk anak?” (아주머니, 아이들에게 마실걸 좀 줘도 될까요?)
“Saya nya kerja di office sana, anaknya di lihat pintar banget”
(저는 저 회사에 다녀요, 아이들이 똑똑해 보여요)
의아한 표정의 아주머니는 아이들 얘기에 금새 경계를 풀고 웃으시며 연신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셨다. 이게 이렇게까지 인사를 받을 일은 아닌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도망치듯 사무실로 돌아왔다. 집에 있는 딸아이 책장에서 더 이상 보지 않는 동화 책들을 골라 사무실에 갖다 두고 야근하는 날이면 편의점 앞에 Eti와 Rudy가 있는지 보고 책을 주거나 편의점에서 산 과자나 음료수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누나인 Eti가 책을 읽어주면 Rudy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책과 누나를 번갈아보며 책 내용에 따라 표정이 변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담배를 피우며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내 어린 시절 땅끝마을 시골학교에도 도시 출신 선생님들은 마을에서 하숙을 하곤 하셨는데 방과 후에 아이들은 죽기 살기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뛰어 놀기 바빴고, 어둠이 내리면 집에 돌아가 저녁식사를 하고 난 뒤, 선생님 댁으로 약속이나 한 듯 모이면 선생님은 책을 읽어 주시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 도시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않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읽어 주시는 이야기들에 빠져들어 온갖 상상력이 다 동원되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곤 했다.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기 위해 누우면 어느새 책 내용을 비롯한 선생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신나는 모험과 새로운 세상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다.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은 방학에는 친구들끼리 모여 각자 읽은 책이나 형, 누나들에게 들은 이야기, TV 이야기들로 쉴 새 없이 조잘대기 바빴다. 선생님께서 가끔 오래된 책을 나줘 주실 때도 계셨는데 희한하게도 그 책은 수십번을 다시 읽어도 질리지가 않았다. 그림 그리는걸 가장 좋아했던 어린시절의 나는 책장의 삽화를 보고 따라 그리기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글만 가득한 책장에 직접 삽화를 그려 넣기도 했다.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고 그 짜릿한 경험이 주는 기쁨을 알기에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해서도 틈만 나면 책들을 읽어대곤 했다.
중학시절엔 공상소설과 무림소설로 무한 상상의 세계관이 생겼고, 고등학교 시절엔 시에 빠져들어 연애편지와 노래가사에 파묻혀 낭만을 만끽하기도 했다.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문우회” 동아리에 가입이었고 전공은 제껴두고 문학 생활에 파묻혀 살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과 나만의 정치관도 생겨났고 시를 쓰겠다고 무턱대고 무전여행을 떠나 몇 주, 몇 개월을 걷고 또 걸으며 내 안에 내재한 자아와 수많은 대화들을 시도했었다.
Eti와 Rudi 남매도 책을 통해 각자 자아의 씨앗 위에 건강한 자양분이 뿌려질 것만 같아 늘 흐뭇했다. 인도네시아 사람인 아내조차도 책을 읽는 것에는 무관심했지만 내가 언젠가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여주기는 했다. 당시의 나는 Eti와 Rudi에게 한글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틈틈히 한글을 가르쳐 보고는 어눌하지만 금새 한글을 읽어내는 녀석들이 신기해 신이 났었다. 금방이라도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 성공할 것 같았고 뭐든 다 해낼 것만 같았다. 젊은 혈기와 열정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시기였지만 Eti, Rudi 어머니의 낡은 리어카나 아주머니의 두꺼운 손을 보면 금새 겸손해져서 미안한 마음에 편의점에 들어가 먹을 것들을 사다 주며 부끄러운 마음을 고해성사하듯 빌었다.
“Etinya mati…” (Eti가 죽었어요…)
언제나 조용히 웃을 뿐 거의 말이 없었던 리어카 아주머니가 회사에 대뜸 찾아와 펑펑 울어댔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친한 직원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처음 그들의 집이라는 곳에 가게 된 셈인데 회사에서 불과 1km도 되지 않는 곳에 커다란 공터와 공터 한켠에 쌓인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그 옆에 판자로 벽과 지붕을 세운 곳이었다. 당황스럽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른 체 경황없이 도착한 그곳에서 나는 또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아이들이 (흙바닥에 기둥만 올려진) 이런 곳에 사는 줄도 모르고 흙 묻은 옷을 나무라기만 했고, 후덥지근한 땀냄새에 왜 씻는걸 게을리 하냐고 나무라며 비누를 사주기도 했는데 판자집은 그냥 봐도 화장실이나 수도 시설이 없어 보였다. 새 옷 한벌 사 입혀 보지도 못했으면서 딸아이의 작아진 옷을 갖다 주고는 의기양양해하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고 미안했다.
문짝도 없는 판자 안에서 하이얀 보자기에 싸여 있는 Eti… Rudi가 Eti의 머리맡에 앉아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다. 덤덤했던 내가 참지 못하고 눈알이 튀어 나갈 듯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죽은 Eti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죽음’이 영원한 이별인 것을 모른 체 누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Rudi의 모습이 왜 그리 서럽고 안타까운지 Rudi를 끌어 안고 한참을 바보처럼 울었던 것 같다. 신은 왜 사람에게 시한부의 삶을 주는 것인가?
Eti는 차에 치었고 수미터를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무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마을 촌장이 동네 주민 차를 빌려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앞날이 창창한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2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하고 병원에서는 별 처치도 없이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누워있는 Eti는 까인 이마만 아니라면 그냥 편안히 자는 것 같았다. 어린 Rudi는 슬픈 표정도 없이 분주하게 집안과 밖을 오갔다… 녀석만 보면 눈물이 나와 바지를 쥐어 뜯으며 다른 생각을 해보려 안간힘을 써야 했다. 가지고 간 돈을 전달하고 허탈하게 회사로 돌아와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퇴근을 했다. 집에 가 잠든 딸아이를 보고 나와 낑낑대며 울먹거리다 괜한 담배만 태우며 속쓰려 했다. 그날 밤 아득하게 잊고 있었던 브레히트의 글귀가 생생하게 가슴에 구두질을 해댔다. ‘살아 남은 자의 슬픔’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이 미워졌다.
Eti를 묻는다는 아침에 판자집에 가니 마을 사람 몇몇과 내가 데리고 간 직원 일행이 다였다. 차마 Eti를 묻는 것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머뭇거리자 아주머니가 또 말없이 머리숙여 인사하고 Rudi가 따라나섰다. Rudi는 판자집 구석 켠에 눅눅히 쌓여 있는 책들 중에서 한 권을 꺼내 들고 갔는데 (Eti에게 주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그냥 내버려 두었다. 혼자 먼 길을 가는 Eti에게 Rudi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또 있을까? Rudi는 자라서도 누나의 존재를 기억할까? Eti는 Rudi의 수호천사로 Rudi의 기쁨과 슬픔을 과연 함께 할 것인가? 무의미한 질문들이 답안을 생각하기도 전에 기차 속 창밖 풍경처럼 휙휙 지나쳐 갔다.
Rudi는 씩씩했지만 가끔 외로워 보였다. 아니 Rudi가 외로운게 아니라 내 삶이 잠시 외로워졌고 씩씩한 Rudi와 그 어머니에게 외로움과 그리움의 덧옷을 내 마음대로 입혀보고는 그들도 외로울 거라 단정지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한참동안이나 Rudi를 보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무작정 Rudi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판자집이 있던 자리는 벽돌담이 들어서고 옆에 있던 건물벽과 이어져 있었다. 동네분들에게 물으니 몇 주 전에 건물 주인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기 땅에 벽을 쳤다고 했다. Rudi와 아주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무심했던 내가 또 미워지기 시작했고 마치 마을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 하는 듯이 느껴졌다.
“저 친구가 Rudi네 애들한테 도움 좀 주면서 으시대더니 정작 죽은 Eti와 집을 잃은 Rudi에게 아무 도움도 주질 못했다지? 뭘 한 거지 저 사람은? 뭐하는 거지 저 사람은?...”
누나를 빗질하던 Rudi의 모습은 한참동안이나 떨쳐낼 수가 없었고 내 뇌벽에 인두로 지져진 듯 선명한 그림으로 남았다. 그로부터 한동안 내게는 죽음이 빗질이고 빗질은 곧 죽음이었다. 이제는 많이 나아져서 가끔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지만 어쩌다가 느닷없이 딸아이가 빗을 내밀며 엉킨 머리를 풀어 달라고 하면 가슴이 쿵쾅거림을 어찌하지를 못한다. Rudi도 나처럼 빗질이 아프고 두려운 시기를 이겨냈을까?
이제 막 Rudi만 해진 막내의 조그만 손을 꼬옥 쥐어보노라면 마치 Rudi의 도톰한 손을 맞잡은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지곤 한다. 녀석도 어딘가에서 어렴풋이나마 나를 기억하며 가슴 따뜻해했으면 좋겠다.
*Teh Botol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인기가 많은 홍차 음료

그리운 아이들 (사진=김기역 )
* 이 글은 '데일리인도네시아'에 함께 실립니다.
- 이전글(47) 이슬람과 사원건축에 대한 오해와 편견 18.08.01
- 다음글(45) 보물을 잉태한 항아리 18.07.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