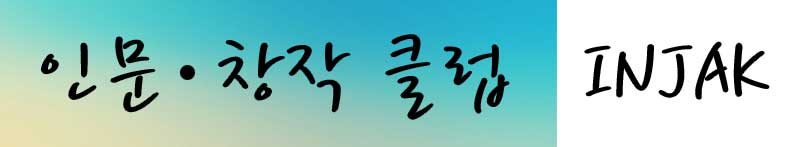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20) 찔랑까한(Cilangkahan) 그곳에 맺힌 한
페이지 정보
본문
찔랑까한(Cilangkahan) 그곳에 맺힌 한
배동선
2008년 당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에는 광산업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2004-2005년쯤 시작된 석탄 열풍을 뒤이은 것인데 철광석, 납, 망간, 니켈 같은 광물들을 찾아 다니는 한국업체들을 따라 교민들 태반이 생업 외에 광산업에도 한 발쯤 담가놓고 현지 파트너로서, 직원으로서, 또는 통역 알바로서 깔리만딴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을 온통 뒤집고 다니며 수고와 발품을 팔았습니다. 나도 그 당시 동부자바 뜨렝갈렉의 망간광산, 보고르 인근 자싱아의 아연광산, 술라웨시 떵가라의 니켈광산, 발릭빠빤의 실리카 광산, 반자르마신의 탄광들을 드나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찾아 다니던 광물들은 대부분 철강제련에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런 광물들도 트렌드가 있어 자못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다 칼로리 높은 석탄을 찾아 전국을 헤맸는데 조금 지나자 납을 찾아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은 망간, 그 다음이 니켈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서울 거리가 온통 검정색 롱패딩 입은 사람들로 일색인 것처럼 당시 광물들도 유행을 탔던 것입니다.
2008년은 인도네시아에서 망간으로 난리가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납이나 망간은 니켈이나 석탄과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 화학기호를 적어가며 물성 차이를 논하려는 건 아닙니다. 요점은 채굴방식인데 석탄, 니켈은 거대한 광맥이 형성된 노천광에서 포크레인으로 지표면부터 떠 담는 반면 납이나 망간은 마치 금광처럼 가느다란 광맥을 따라 굴을 파고 들어가며 채굴한다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규모로 망간광석을 채굴하는 곳에선 산마다 수십 개의 토끼굴 같은 것이 짧게는 몇 십 미터, 길게는 백 수 십 미터씩 구불구불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그런 굴들은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광산 인명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
난 당시 포항에서 온 수상한 사람들과 함께 서부자바의 망간광산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땅거랑-메락 톨을 타고 가다가 발라라자(Balaraja)에서 내려 국도로 세랑을 거쳐 한참을 남쪽으로 진행하면 자바섬의 남쪽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바다를 바라보며 좌회전하면 곧바로 말링삥(Malingping)이라는 면(面)이 나옵니다. 그곳에도 당시 수 백 개의 망간광산 토끼굴들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한 물량을 구하지 못하면 해안을 타고 동쪽으로 한참을 더 달려 바야(Bayah) 면까지 들어가 원광석들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더 이상 말링삥에 갈 일이 없어졌을 때 다 옛날 일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길은 멀고 바다 말고는 딱히 볼 만한 풍경도 없었으며 망간광풍 역시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최근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 의 삽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860년에 네덜란드어로 처음 발간된 고전소설 번역팀의 일원이 되어 책 한 권을 통으로 1차 번역을 한 것에 이어 책에 넣을 삽화까지 요청 받은 것입니다. 서부 자바의 르박(Lebak)군(郡)을 주무대로 하여 당시 네덜란드 총독부와 현지 귀족들에게 수탈당하던 자바 민중의 현실을 고발한 이 책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소개되면서 세계공정무역의 지평을 열었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사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어느 나라에서 저작권 소송을 맞을 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무명화가(!)가 새로 그린 따끈따끈한 삽화가 가장 안전하고도 저렴한 대안이었겠죠.
그 중 지도삽화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생각지도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설의 주무대인 행정소재지 랑까스비뚱은 르박군의 북쪽 끝인데 수없이 다녔던 말링삥도 르박군 서남쪽 구석에 위치한 면이었던 것입니다.
<막스 하벨라르>에서는 유일한 재산이자 논을 경작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소들을 탐욕스러운 영주에게 빼앗기고 생계의 벼랑에 내몰려 르박군을 떠나는 순박한 순다 농민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들은 가혹한 수탈을 피해 보다 안전한 소작지나 새로운 일감을 찾아 보고르로, 까라왕으로, 바타비아로 달아났지만 통행증이 없다는 이유로 붙잡히면 태형을 당한 후 고향으로 송환되어 영주들에게 또 다시 치도곤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남쪽해안으로 도망쳐 찔랑까한이라는 포구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지도를 보니 우리가 바야로 들어갈 때 늘 지나치던 말링삥의 작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160년 후에도 여전히 작고 아름답기만 한 그 포구의 지명이 찔랑까한인지 당시엔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르박을 떠난 이들을 태운 작은 배는 남쪽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위태롭게 항해해 자바의 서쪽 끝 빠나이딴(Panaitan)섬을 왼쪽으로 끼고 돌아 곧바로 순다해협을 건너 수마트라의 람뿡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수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한창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던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르박을 탈출한 사람들은 그들만으로도 부대를 편성할 만큼 수가 많았지만 대부분 네덜란드 점령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수마트라에서의 짧은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찔랑까한에서 배에 오른 이들 대부분은 다시는 순다의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삽화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총독부 시절 수탈에 허덕이던 그곳 민초의 후손들이 이제 경제논리에 떠밀려 산속 망간광산에 위험한 토끼굴을 파고 들어간 모습을 떠올리며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삶은 과연 옛날보다 나아진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찔랑까한의 작은 포구를 당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지나쳐 다니기만 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어느 구석이든 사연 없는 곳이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지역과 역사를 공부했다면 말링삥과 바야 여행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 말입니다.
관련 역사를 조금 알게 되는 것 만으로 그 소박한 포구의 기억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은 참 새삼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보았던 찔랑까한의 앞바다가 그토록 깊고 푸르렀던 것이 오래 전 람뿡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이 그토록 깊고 시퍼런 한을 그곳에 남겼기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
- 이전글(21) 발리는 지금 18.01.25
- 다음글'인문창작클럽' 2기 출범 18.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