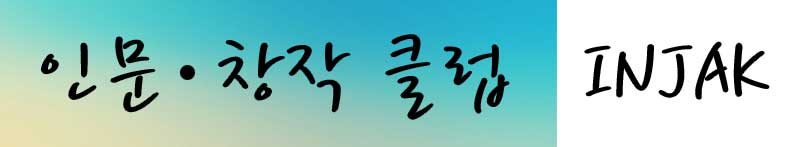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88) 꽃나무 단상
페이지 정보
본문
꽃나무 단상
글과 사진 / 조현영
이사하기로 한 집 문 앞에는 아담한 꽃나무가 하나 있다.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꽃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이 집으로 이사오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큰 저택도 아니고 아담하고 심플한 집이었지만 문 앞에 다소곳이 꽃가지를 드리운 꽃나무가 집격(?)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 그래, 이 집이야’ 김혜자광고 버전으로 이사할 집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정과 직관에 근거한 판단을 통해 삶의 주요한 일들을 결정한다’는 한 심리학자의 이론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평소 사소한 직관과 주관적 감성으로 많은 선택을 해왔던 나로서는 새삼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 집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길어진 줄기가 무거워진 듯 살짝 늘어진 꽃가지의 선과 언뜻 보이는 꽃은 전경이 되고, 소박한 현관문과 흰 벽은 배경이 되어 잘 어울리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한 폭의 그림을 뚫고 늘어진 꽃가지와 먼저 마주하여 눈빛 교환을 한 다음 고개를 들어 꽃에게 인사를 건넨 후 잎새들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고개 숙여 겸손한 신고식(?)을 치루고 나서야 그 집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열려라 참깨’류의 상상에까지 이른다. 햇살이 화사한 날 문을 열어두고 집안에서 바깥 쪽으로 바라보자면, 늘어진 꽃가지는 바람에 살랑거리며 잎새 사이로 내리는 햇살 조각들은 또 눈이 부시게 좋았다.
이사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은 분명 나를 위해 그리 했을 것이다. 이사 들어가기 전 집 구석구석을 짚어가며 이런 저런 요청이 많았던 나를 의식했는지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심지어 자르지 말라고까지 말했음에도 우리 집 앞 쪽으로 내려온 가지들만 쌍둥쌍둥 다 쳐놓은 것이다. 늘어진 가지만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윗 부분을 아예 잘라내 버렸다. 작정한 티가 너무 나지 않은가 말이다. 집주인은 걸치적거리지 않고 깔끔해보이라고 다 잘라냈다며 못 알아듣겠는 인니어로 자랑스레 설명한다. 고맙다는 말은 커녕 잘려진 꽃가지들을 향한 나의 탄식과 원망을 집주인은 눈치챘는지 금방 자랄 것이라는 말만 던져놓고 부랴부랴 자리를 떠 버렸다.
나무 앞에 서서 우두커니 한참을 바라보았고 이미 잘려나간 가지에 대한 미련은 어서 버리기로 했다. 소용없이 쌓아두었다가 이사올 때서야 겨우 버려 낸 헌짐들처럼 그렇게. 새로 돋아나는 잎파리들을 지켜보며 ‘지금 그리고 여기’의 삶에 집중하기로 한다.
미련따위는 버리기로 했으나.. 나의 뒤끝이 만리장성이라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줘야겠는데..

*이 글은 '데일리 인도네시아'와 함께 실립니다.
- 이전글(89) 아데니움, 그 사랑이야기 19.05.22
- 다음글(87) 해변의 모스크 19.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