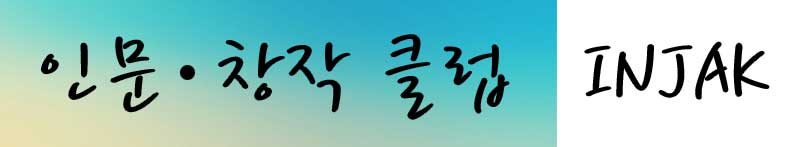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3) 머리 냄새가 맡고 싶어, 엄마
페이지 정보
본문
머리냄새가 맡고 싶어, 엄마
최장오
그 냄새가 동백기름 같기도 하고 시큼한 땀냄새 같기도 하고 물큰 비 냄새 같기도 한데
기억 속엔 미끌미끌하니 영 잡히지가 않는다.
찬밥 한 덩어리에 노곤해져 툇마루에 곤하게 자던 아이 하얗게 눈 까뒤집으며 버둥거린다, 경끼.
엄마는 아일 들쳐 업고 서낭당 너머 침쟁이 있는 반주막까지 십여리 길을 내달렸다.
희미한 정신줄 속에서도 목덜미로 타고 흐르던 아득한 머리냄새,
검정고무신 뒤꿈치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다.
반주막(半酒幕) 불빛을 뒤로 타박타박 걷던 언덕배기에서도 선연하고 깊은 머리 냄새가났다.
오래 전, 서낭당 돌무더기 깔고 앉은 간이 정류소
산 그림자만 머물고 엄마의 머릿수건은 서둘러 바람에 날려가고 기억은 자꾸 미끄러져 내린다.
***시작노트
수까르노하따 공항에 첫발을 내딛던 그 날, 끈적끈적한 열기와 함께 온 몸을 자극하던 냄새
그 특유의 인도네시아의 냄새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냄새가 나의 일부인 양 이십여년 넘도록 그렇게 살아왔고, 강렬하던 향기가 언제부터인가
무뎌지기 시작했다.
몸 속 깊이 내재된 냄새는 그런가 보다,
잊고 살아가다 간혹 몸살처럼 살아나는 냄새가 있다 향수처럼……
어릴 적 몸 속에 숨어 있던 젖내 같은 추억이 그렇다 불쑥불쑥 찾아오곤 한다
어머니인가 고국인가 하는……

(사진 : 조현영 / manzizak )
* 이 글은 '데일리 인도네시아'에도 함께 실립니다.
- 이전글(4) 오래된 아침 / 노산여인숙 17.09.28
- 다음글(2) 울렌 센따루 박물관 (Museum Ullen Sentalu) -2 17.09.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