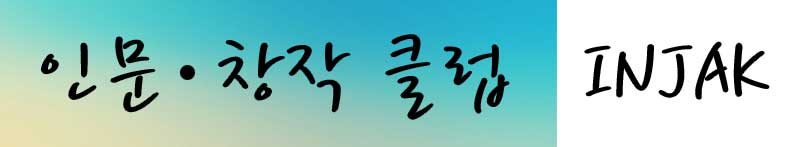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79) 시골쥐 엄마 이야기
페이지 정보
본문
시골쥐 엄마 이야기
조은아
얼마 전 외국인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 자리에서 건너 건너 아는 한국 아이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아이는 이웃 동네의 제법 규모가 큰 국제 학교에 다니는 데, 방과 후 과외 학습이 너무 많아 정작 학교에 와서는 아이가 날마다 잠을 자더라는 것이다. 보다 못한 담임이 부모를 불러 학교와 교사를 믿고 과외를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다. 뭐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보통의 일인 것을, 머리 노오란 외국인 친구들은 마치 큰 뉴스라도 전하듯 놀라워 했다. 그리고 봇물 터지듯 너도 나도 학교에서 겪고 들은 한국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네 학교에도 한국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늘 방과 후에 학원을 가거나 개인 교습을 한다며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단다. 자카르타에서 손꼽히는 비싼 국제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학교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학부모의 대다수는 한국인이며, 심지어 어느 국제 학교는 한국 학부모들의 컴플레인 때문에 숙제의 양을 늘렸다고도 했다. 교육열 세계 최강인 인도인들도, 최근 교육열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중국인들도 그 정도는 아니라며 혀를 찼다. 아이들은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하길 바라면서 엄마들은 영어도 인도네시아어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고. 아이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며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행복’하냐고 걱정을 했다.
나와 남편은 ‘그런 한국인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변명하며 허허 껄껄 웃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린 정말 씁쓸했다. 하긴, 최근 우리는 인기 드라마 [SKY 캐슬]을 통해 우리의 교육 현실을 다시금 깨닫지 않았던가. 초등교육을 위해 유치원에서 누리 교육을 하고, 중학교를 가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중학교 입학부터 학원과 과외를 하는 것은 예삿일이다. 영어 학원도 상/하위 그룹으로 나누고 상위 그룹의 영어 학원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하위 학원의 테스트를 준비하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유치원에서부터 준비해 명문 대학생이 되어도 그들은 또 다시 ‘취직’이라는 고지를 향해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
50을 향해 달려가는 나조차도 한밤중에나 학교 문을 나설 수 있었던 보통의 과거가 있지 않은가. 한국인들 중, 한국에서 자라면서 학습지, 과외, 학원, 야간 자율 학습, 시험 부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은 몇이나 될까? 왜 우리는 OECD 가입국 중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하위인 나라가 되어 있는 걸까.
그 날의 주제는 돌고 돌아 아이들의 ‘행복’이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나와 남편을 ‘a Fake Korean’, ‘Orang Korea palsu’라 놀렸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다른 한국 엄마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너는 다른 한국 엄마들을 보면 불안해지지 않니?”라는 질문을 받을 만큼 나는 참 게으른 엄마다. 사실, 나는 깜뿡 생활 8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너는 다른 한국 엄마들을 보면 불안해지지 않니?”라는 질문을 받을 만큼 나는 참 게으른 엄마다. 사실, 나는 깜뿡 생활 8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우리 딸들은 보고르에 있는 아주 작은 국제학교(두 살부터 7학년까지 전교생 40여명)에 다니고 있다. IB 커리큘럼이라 두 살부터 PYP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두 살부터 다닐 수 있다는 뜻이지, 처음부터 IB니 PYP 교육이니 이런 걸 알고 선택했던 학교가 아니었다. 집 주변에는 외국인이 다닐 만한 학교나 유치원이 없고, 한국처럼 문화센터도 없으니 산골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마당에만 둘 수 없어 그나마도 30분 거리의 보고르 시내에 유일한 국제학교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냈던 거였다. IB 커리큘럼 자체가 창의력 위주의 교과서 없는 토론형/참여형 교육이기는 하지만, 이 학교는 특히 더 자유로웠다. 이렇게 놀아도 되는가 싶을 만큼 학교 행사도 많다.

< 아빠들과 모여 재활용품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아이들 >
재활용품을 늘 학교에 쌓아두고 무언가를 매일 만들고, 숙제는 주로 학교 도서실에서 내어 준 책을 읽어 오는 것인데 그것도 금요일에는 없다.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정말 신나게 뛰고 놀았다. 한 학년에 학생이 고작 두 서넛인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느냐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큰 아이가 4학년이 되도록 아이 학습에 관해 거의 신경을 써 본 일이 없다.
학생 수가 적으니 교사는 아이들마다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맞는 각각의 과목별 학습 진도를 나가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사는 지도 방법을 바꿔가며 아이가 흥미를 가질 때까지 이끌어 주니 내가 집에서 딱히 할 일도 없었다.

<환경 캠프에서 오랑우탄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일주일에 두 번 발레를 가고 일주일에 한 번 큰 애는 그림을, 작은 애는 태권도를 하는 것이 방과 후 활동의 전부다. 사실, 보고르에는 한국 아이들이 다닐 만한 보습 학원도 없고, 산골까지 과외를 하러 와 줄 선생님도 없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자카르타로 과외를 하러 다닐 만큼 나는 부지런한 엄마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잘 뭉쳐서 놀았다.
학교가 작으니 학부모들끼리도 서로 친해서, 주말이면 함께 모여 수영도 하고 공원을 가거나 트레킹 같은 야외 활동을 한다. 아이들의 생일을 거의 전교생이 함께 축하하고 파티도 함께 할 뿐 아니라, 각 나라의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낸다. 또 방학이면 각자의 나라로 초대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다.

<주말 트래킹>
지난 음력 설 연휴에 광저우에 살고 있는 친구 가족이 우리집에 놀러온 적이 있다.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보내고 돌아가면서 친구는 ‘서울쥐와 시골쥐’가 떠오른다고 했다. 늘 아이의 학습 진도에 촉각을 세우고, 과외 선생을 찾고 매일 학원을 뛰는 것은 광저우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의 생활이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이다. 참 감사했다. 좋은 표현으로 여유로운 것이지, 한심하다고 할 사람도 분명 있을 테니 말이다. 심지어 친정 엄마도 “애들 이렇게 놀아도 되니?”라고 하셨으니 말이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큰 도시에 살았다면 이런 작은 시골 학교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SKY 캐슬 여주인공이 부럽지 않은 극성 엄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가끔은 나도 다른 한국 엄마들의 명문대학 합격기를 보면서 ‘나는 이래도 되나?’ 불안할 때도 있으니 말이다. 나는 그저 시골쥐 엄마일 뿐이다. 눈 앞의 성적에 연연해 하지 않고 아이가 행복한 게 최고라 믿는.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면 스스로 행복해 지는 바른 길을 찾으리라고.
아이들은 지금 그냥 꿈을 꾸면 되고, 꿈을 향해 가면 되고, 자신이 밤을 세워도 즐거운 일에 빠지고,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나의 기대고, 바램이다. 그것이 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다.
“윤진이는 누구 딸?”
“엄마 딸!”
“윤진이는 누구꺼?”
“윤진이 꺼!”
“그니까 엄마가 윤진이 인생을 대신 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윤진이 인생은 윤진이꺼!”
“엄마 딸!”
“윤진이는 누구꺼?”
“윤진이 꺼!”
“그니까 엄마가 윤진이 인생을 대신 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윤진이 인생은 윤진이꺼!”
뭐 물론, 우리 딸이 ‘인생’이란 단어를 완벽히 이해했으리라곤 결코 생각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자신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뿐이다.
정답은 없다.
나름의 환경과 목표와 재능 등등에 따라 당연히 학습 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이 맞다. 나도 아이가 더 크면 달라질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나태했다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방법도 과정도 선택도 모두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한가지, 모든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엄마만 만족하며 사는지, 아이도 정말 행복해 하는지 말이다.
정답은 없다.
나름의 환경과 목표와 재능 등등에 따라 당연히 학습 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이 맞다. 나도 아이가 더 크면 달라질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나태했다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방법도 과정도 선택도 모두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한가지, 모든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엄마만 만족하며 사는지, 아이도 정말 행복해 하는지 말이다.
모두의 대답이 YES 였으면 좋겠다. [SKY 캐슬]의 결말이 해피엔딩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 글은 '데일리 인도네시아'에 함께 실립니다.
- 이전글(80) 자카르타의 디아스포라, 끄망(Kemang) 19.03.25
- 다음글(78) 비워주는 마음 19.0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