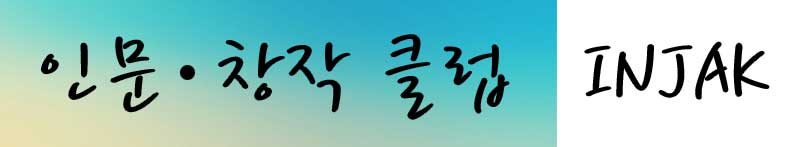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118) 단편소설/ 백골의 향연
페이지 정보
본문
[단편소설]
백골의 향연
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산 속에서 엄마와 단 둘이 사는 씨티는 깊은 계곡 바위 틈과 정글 속 큰 나무들 밑에서 버섯을 따다가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산의 마물들은 인간과 상극이지. 마그립 무렵 이상한 것들이 말을 걸더라도 절대 대꾸해선 안된다.” 이미 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숲속에서,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기억해 낸 씨티는 갑자기 밀려드는 한기에 옷깃을 여몄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어둡고 멀기만 했고 컴컴한 숲속에서는 짐승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씨티”, “씨티야”
씨티는 귀를 막고 집 반대편인 산비탈 아래, 저녁 하늘을 환하게 밝힐 만큼 출력높은 조명을 둘러놓은 벌목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서 저녁시간을 보내다가 달이 높이 떠올라 밤길을 밝히면 그때 집에 가기로 씨티는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벌목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분명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씨티는 짐짓 화난 듯 소리쳤습니다.
“벌목장 사람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밀려난 것들이 난 여자라 얕잡아 보고 달라붙으려는 거야?”
벌목장 캠프가 들어서기 전엔 씨티는 버섯을 따러 다니면서 정글 속 짙은 그림자 속에 깃들어 있던 “그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허락없이 그들 보금자리 앞을 지나기라도 하면 온갖 살(煞)을 뿜어대며 패악질을 저지르고서도 정작 벌목이 시작되고 큰 나무들이 속절없이 잘려 나가면 찍소리 못하고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그들”이 씨티는 딱히 두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간다!” 벌목장 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던 나무 한 그루가 큰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진 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는 벌목장 사람들은 부지런한 게 틀림없습니다. 등 떠밀려 그러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넘어간다!” 또 큰 나무 하나가 굉음을 내며 수백 년의 생을 전기톱 앞에서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씨티는 더 이상 그쪽으로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아 발을 멈추었는데 마침 멀리서 눈이 마주친 벌목장 인부 한 명이 씨티를 가리키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한뚜!!” 숲에서 오래 살아, 명품 옷이나 최신식 오디오 헤드셋을 차고 있지 않다 해서 한뚜, 즉 귀신 취급을 받는 건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싸~한 느낌이 든 씨티의 머리 위를 거대한 흰색 물체가 살짝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따라오고 있던 것의 실체였습니다. 아까 벌목장 인부가 뻗었던 손가락이 조금 윗쪽을 향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사실 그녀 등뒤에서 나타난 ‘저것’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거대한 백골이 뼈마디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씨티 머리 위를 넘어 벌목장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살짝 뒤돌아보던 백골과 엉덩방아를 찧던 씨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실 눈이 마주쳤다고 하기 매우 어색한 것이 백골 거인의 해골 눈 속엔 눈동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이 마주쳤다 느낀 것은 씨티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달아나는 벌목장 사람들과 중장비들을 뒤집어 엎는 백골을 보면서 씨티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누워 버렸는데 마주 보인 하늘에선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뚜 떵꼬락이 또 나타났다구요!” 다음날 아침 산 아래 이장댁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지르고 있었습니다. 수나르디 이장은 쯧쯧 하며 혀를 찼습니다.
“어제 그 놈과 마주친 인부들이 몸이 펄펄 끓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저 산은 원래 마물들, 귀신들이 들끓던 곳인데 무작정 들어가 벌목을 하고 있으니….”
이장은 사람들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말 좀 들어봅니다. 원래 해 지기 전까지만 작업하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푸른색 유니폼 자켓을 입은 남자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납기라는 게 있어요. 제재소에 물건을 보내기로 한 날짜가 있다고요. 그렇잖아도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납기를 맞추려면 야간작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을에서 두꾼이라도 불러와 귀신들 쫒아줘야 하는 거 아니오?”
“이 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마을이랑 이장님이 책임져 줘야 하는 겁니다.”
벌목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벌목장에서 일하는 주민도 있으니 벌목회사에 동조하는 이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었지만 수나르디 이장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압두라흐만 알카드리가 누군지 아시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머리를 갸우뚱 했습니다. 수나르디 이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서부 깔리만탄에 뽄띠아낙 도시를 처음 세운 술탄이요. 그 도시 이름이 왜 뽄띠아낙…., 처녀귀신이란 뜻이겠소? 그들이 파괴하여 도시를 세운 그 숲이 원래 귀신들, 마물들의 것이었는데 알카드리가 정글 속으로 화포를 쏴대며 들어가 기어이 대대적인 개간을 통해 귀신들 본거지에 뽄띠아낙을 세운 거요.”
회사 사람이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화포라도 쏘면서 벌목작업 하라는 뜻입니까?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요?”
이번엔 이장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원래 살던 이들을 내보내고 그 집을 차지하려면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오? 그런데 당신들은 무작정 불도저 몰고와 정글을 갈아 엎으려 하니 거기 살던 마물이든 뭐든 반발하는 건 당연하지 않소?”
마을사람들이 이장에게 닥달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다 동의서 쓴 일입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길도 놓여야 마을 사람들 생활도 나아지고 수입도 생길 것 아니오? 이장은 산속 귀신들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오?”
수나르디는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산이 황폐해지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바라본 그 지역은 일견 온통 정글로 뒤덮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산속 마을들을 중심으로 벌목장과 광산들이 점점 그 면적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축구장 몇 개 면적의 거대한 고목들이 잘려나가는 벌목 현장들에서 오늘도 야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또 잘려 넘어지며 산 속에 굉음이 메아리졌습니다.
“야간작업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회사가 너무하는군.” 인부들이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정작 위험한 건 그것만이 아니잖아. 이 숲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맞아, 어제도 이웃 현장에 해골귀신이 나타났다지.”
“요즘 세상에 귀신은 무슨….”
“그것뿐이야? 사람인듯 아닌 듯 한 것들도 심심찮게 보인다니까.”
“단체로 술이라도 마시고 헛걸 본 거겠지”
그때 벌목장 한쪽에서 소란이 벌어지며 고함소리와 비명이 섞여 들려옵니다.
“저 놈한테 잡히면 살아남지 못해! 장비 버리고 달아나!”
잡담하던 인부들이 기겁을 한 것은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흰색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뚜 떵꼬락이 정글에서 벌목장 공터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벤 나무를 끌고가던 중장비가 뒤집어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캠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씨티는 멀리서 그 소동이 마무리되기까지 한참동안 지켜보다가 버섯이 가득 든 짐을 챙겨 산속 집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에서도 저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는데 여기서도 또 다시 보게된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솔길을 오르던 중 또 뭔가 따라오는 느낌에 홱 뒤를 돌아본 씨티는 바로 등 뒤까지 따라붙은 흰색 연기가 꿈틀꿈틀 실루엣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씨티가 털썩 주저앉자 연기는 키 큰 백골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동안 쳐다보던 씨티는 그렇게 앉은 채로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지를 세우고서요. “람베르투스. 잘 했어.”
한뚜 떵꼬락 람베르투스는 머리를 긁적거립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씨티는 날렵하게 일어나며 다시 산속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 밑으로 삐져나온 씨티의 긴 꼬리가 달빛에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숲은 곧 없어지고 우린 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람베르투스는 없는 혀를 차며 대꾸했어요.
“너희 모녀는 내가 지켜줄게.”
씨티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내 꼬리 밟지 마!”
하지만 싫은 표정은 아니었으므로 람베르투스는 헛웃음을 웃습니다.
“너희 어머닌 날 좋아하셔.”
씨티는 또 다시 쏘아붙이죠.
“그럼 우리 엄마랑 결혼해!”
하지만 로맨틱한 한뚜 떵꼬락 람베르투스와 호망 소녀 씨티가 인간들로부터 숲을 지켜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PS. 한뚜 떵꼬락: 주로 개천, 정글, 대나무 숲에 출몰하는 백골 귀신으로 키가 3미터를 훌쩍 넘는다고 하며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 딱딱한 것으로 집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동반한다. 떵꼬락 귀신을 만난 사람은 심하게 앓게 되고 몸이 닿은 부분은 시퍼렇게 멍들거나 썪어 들어간다.
호망: 깊은 밤 숲속 오솔길에서 자주 마주치며 인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손가락 순서가 반대라고 한다. 바딱 전설에 따르면 호망의 딸 마르기링 라웃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었고 사리부라자와 결혼해 시사라보르보르를 낳고 하라합, 루비스 마똔당 등 바딱 유명 가문들의 시조가 된다.
*이 글은 '데일리 인도네시아'에 함께 실립니다.
- 이전글(119) 길 19.12.23
- 다음글(117) 별이 되는 마을 19.1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