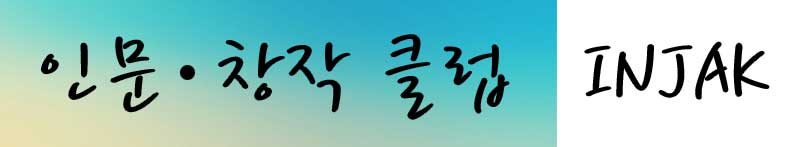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174) 이부 니닝 이야기 (Covid 19 in Kampung)
페이지 정보
본문
이부 니닝 이야기 (Covid 19 in Kampung)
조은아
“Nyonya bibi Nining meninggal tadi di subuh”
“Apa? Mengapa dia tiba-tiba meninggal? Apakah dia kena corona?”
“Tidak. cuma meninggal saja saat dia sedang tidur. kemungkin Tuhan nya membutuhkan dia.”
어머나... 외마디를 외치곤 나는 주저앉아버렸다. 한국 가면서 ‘선물 사올테니 놀러와’ 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그녀였는데... 해맑게 웃던 그녀가 그렇게 갑자기 죽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니닝은 3년 전 처음 우리집에 왔다. 나보다 6살이나 어렸지만 손녀까지 있는, 작은 키에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순박한 산골 아줌마였다. 2살 난 딸이 있는 큰 딸은 이혼을 한 후 친정으로 들어왔고, 둘째 딸은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남편은 3~4일에 한 번씩 외박을 하더니 3~4일씩 안 들어오다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노라 했다. 그래서 두 딸 중 하나라도 취직을 할 때까지 자신이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12년 동안 여러 명의 도우미를 겪었지만 유독 그녀가 나에게 애틋했던 것은 그녀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 때문이었다. 처음 우리집에 오던 날 그녀는 부엌의 양문 냉장고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열어요?”라며 냉장고문 이음새마다 손바닥으로 더듬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양문형 냉장고의 문 여는 방법을 궁금해 했다. 가끔 TV드라마에서 보기는 했는데 여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고 했다. 2000년대를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
니닝은 구능굴리스 산골에서 태어나 카사바 농장에서 일하던 부모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며 초등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아예 집안일만 하다가 앞집 늙다리 총각과 떠밀리듯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낳고...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카사바와 바나나 나무로 이뤄진 구중궁궐 담벼락안 같은 깜뿡 밖을 나갈 일이 거의 없었다. 생전 처음 들어와 보는 외국인의 집이 우리집이고 처음 대화를 나눠보는 외국인이 나였다.
“뇨냐 전기 사뿌가 청소를 너무 잘해요!”
“손으로 빨래를 짜지 않았는데도 거의 말린 것처럼 짜져요!”
“남은 밥을 전자렌지에 돌렸더니 바로 한 것처럼 따끈따끈해졌어요!”
양문 냉장고뿐 아니라 청소기, 세탁기, 전자렌지 사용도 그녀에겐 처음 해보는 신기한 ‘신문물’이었다. 매일 한가지씩 사용법을 익히며 그녀는 매우 즐거워했다.
몇 달이면 큰 딸은 취직을 하겠지 했지만, 일 년이 지나도록 집에만 있었다. 다음 해, 작은 딸이 졸업을 하면 금새 일자리를 찾겠지 했지만, 그녀도 다시 일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결국 니닝은 우리집에서 3년을 꽉 채워 일을 했다.
남편은 가출하고 장성한 딸들은 집에서 놀며 엄마가 도우미 일로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답답한 일이지만 매사 긍정적이었고 항상 밝은 얼굴로 지냈던 니닝이었다. 외출이 익숙치 않은 탓에 친구도 없었고,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손녀와 노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즐거움이었던 착하디 착하기만 한 젊은 할머니였다. 그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는 단 한번도 남을 통해 되돌아 오는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있었고 우리는 허물없이 속 얘기도 나누는 친구이자 언니 동생처럼 지냈다. 이 산골에서 유일한 내 말동무이기도 했다.
“드디어 우리 딸이 돈을 벌게 되었어요!”
작은 딸이 취직하던 날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좋아했었다. 어린 나이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 가끔 허리를 아파했는데, 이제 집에서 손주와 놀면 다 나을거라며 신이 나서 돌아갔다. 그게 그녀와의 마지막이었고 그녀는 다시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너희는 왜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니?”
나는 니닝의 딸에게 전화를 해 따지듯 물었다. 아픈 엄마를 집에만 두었던 그녀들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죽기 며칠 전부터 기침을 했고, 자다가 호흡 곤란을 일으켜 죽었다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사인이 분명 코로나임을 가르키고 있었다.
“괜찮아요.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코로나는 확진이 되면 나라에서 치료비를 다 내지 않니?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 한번 받게 하지 그랬어?”
“공짜로 치료해주는 병원은 다 꽉 찼어요. 우리는 돈이 없고 나까지 집에 격리되어 있으면 누가 돈을 벌어요?”
그랬다.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서민들의 모습이었다. ‘코로나 확진’이란, 당사자 뿐 아니라 접촉자의 강제 테스트와 격리, 비싼 병원비 등을 뜻하는 말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깜풍 사람들에겐 알아도 아는 척 해선 안되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유였다. 코로나에 걸리면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앓다 죽거나 혼자 견뎌내고 나오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동안 남은 가족은 그저 방문 밖에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니닝이 떠난 이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에서 부고가 들려왔다. 거의 매일 깜뿡에선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이가 많아서, 지병이 있어서, 그냥 신이 원해서... 그래서 죽는다고만 했다. 어느 누구 하나 코로나의 ‘코’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확진자라는 걸 아는 순간 동네 청년들이 가족 모두를 집안에 가두고 못 나오게 지킬 지도 모른다고 무서워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엔 산골마을은 전과 다름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도시의 거리는 사람이 줄어 쓸쓸해졌다지만 깜뿡은 오히려 전보다 더 붐빈다. 와룽이나 동네 공터에는 이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고 마을 골목골목 담벼락 아래마다 주민들이 줄지어 앉아 있다.이것이 바로 정말 위험하고도 슬픈 깜뿡의 현실이다.
차안에서 찍은 동네 주민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없다.(사진=조은아)
도시의 카페, 식당, 미용실, 마사지샵 등이 줄줄이 문을 닫고, 백화점과 상점, 공장 등에서 직원을 줄이면서 도시에서 돌아온 실업자들로 마을 주민 수는 늘어났다. 집안에 노인들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더구나 아이들이 등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좁디 좁은 방 안에 모여 있기 보다 차라리 길가로 나와 하루 종일 넋을 놓고 있는 이들이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쓴 이들은 거의 없다.
“저 오늘부터 일하러 못 나갈 것 같아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한 명 남은 도우미도 갑자기 사직서를 휴대폰 문자로 날려왔다. 시할머니 장례식에 다녀온 시부모가 앓기 시작해서 딸을 맡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게 이유였다.
“코로나 아니니? 병원에 가보지 그러니?” 라고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Tidak apa apa” 였다. 나도 불안해서 그녀를 붙잡지 못했고, 더 이상 사람을 구하지 않고 나 혼자 버텨보기로 했다.
내가 사는 빌라 단지도 출퇴근 인원을 50%로 줄였다. 되도록 외부인의 출입은 금하기 위해 정문을 닫고 외부 오토바이는 경비초소까지만 허락되었다. 10가구 남짓 살았는데 우리집을 포함에 다섯 가구만 남고 한국으로 다 떠나버렸다. 원래도 조용했던 마을인데 무서우리만큼 더 적막해지고 말았다. 정문을 꼭 걸어 잠근 이 깜뿡 안의 더 높은 담벼락 안에서 나는 아이들과 현관문까지 잠그고 은둔 중이다.
바람이 불 때 마다, 문득문득 바람처럼 사뿐사뿐 걸어오던 해맑은 니닝의 얼굴이 떠오른다. 한국에서 그녀의 선물로 사 온 원피스 한 벌을 옷장 안에서 발견했을 땐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다. 코로나로 장례식도 못하고 땅에 묻힌 그녀에게 돈 봉투를 달랑 위로라며 보낸,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니닝을 위해 산 옷과 그녀가 좋아했던 몇 가지를 그녀의 딸들에게 보내야겠다. 곧 마음 놓고 대문을 열고 사람을 집에 들일 수 있는 때가 오면 제일 먼저 니닝의 가족을 초대해야겠다. 어서 저 대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 이전글(175)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국제화: 유학생들의 시점에서 본 현재와 미래 21.04.03
- 다음글(173) 택만이 아저씨 21.03.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